
항복한 진졸(秦卒)들의 움막이 밤늦도록 수런거리자 제후군의 장수 한 사람이 몰래 엿들었다. 듣고 보니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다. 곧 항우를 찾아보고 그 일을 알렸다.
“뭐야? 그 버러지 같은 것들이….”
그 장수의 말을 듣고 난 항우는 화부터 먼저 냈다.
그도 그럴 것이 항복한 진졸 20만은 진작부터 항우의 골칫거리였다. 무기를 주어 싸우게 하자니 영 미덥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런 대군을 한곳에 가둬둘 수도 없었다. 장함이 있어 여느 포로처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손님처럼 모시기에는 성가시기 짝이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혼(鬪魂)으로 차있고, 모든 사고는 전략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항우에게는 언제부터인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그들 20만까지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 되어 있었다.
“경포와 포(蒲)장군을 불러라!”
그 장수가 나가고도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항우가 갑자기 곁에 두고 부리는 군사에게 그렇게 명을 내렸다. 범증이나 계포를 부르지 않고 경포와 포장군을 부르게 한 것부터 딴 뜻이 있었다. 범증이나 계포는 항우가 진나라 항병(降兵)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말만 하면 얼른 좋은 말로 달래 왔다.
“귀찮더라도 관중(關中)에 들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지금 상장군께서 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는 함곡관에 이르는 동안에 촘촘히 늘어선 수많은 성곽과 보루(堡壘), 관진(關津)을 지키는 진나라 장졸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군께서 저들을 해치시면, 그 성곽과 관진은 모두 철옹성(鐵甕城)이 되어 앞을 막고 그 안의 진나라 장졸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맞설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함곡관을 300리 넘게 남겨두고 있는 곳에서 진졸들을 달리 처결하려들면 그들은 펄쩍 뛰며 말릴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항우 자신과 같은 무골(武骨)인 경포와 포장군은 뜻을 같이해 줄 것 같았다.
오래잖아 경포와 포장군이 항우의 군막으로 불려왔다. 항우가 두 사람에게 들은 말을 간략하게 전한 뒤에, 쓸데없이 두르거나 덧붙이고 꾸미는 법 없이 자신의 뜻을 밝혔다.
“새로 옹왕(雍王)이 된 장함과 상장군으로 올려 세운 사마흔(司馬欣)과 진군선봉(進軍先鋒)이 된 동예(董예)를 빼면 진나라의 장졸들은 아직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오. 거기다가 머릿수까지 많으니, 관중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불복한다면 틀림없이 일이 위태롭게 될 것이오. 차라리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장함과 사마흔과 동예만 살려 진나라로 들어가는 길잡이로 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포장군이 잠시 무언가를 망설이다가 범증과 비슷한 말을 했다.
“저들이 짐스러운 것은 틀림없으나 이곳 신안에서 함곡관까지는 아직도 300리가 넘는 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모조리 죽인다면, 가는 동안에 있는 성곽과 관진을 지키는 진나라 군사들은 모두 싸우다 죽을지언정 항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포는 생각이 달랐다.
글 이문열 그림 박순철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권대영의 K푸드 인문학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황형준의 법정모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三. 覇王의 길](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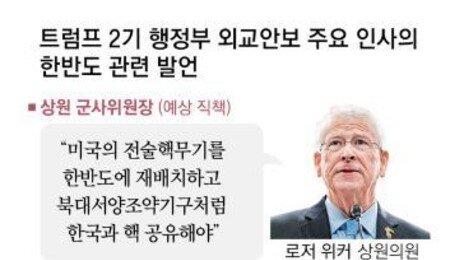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