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상((력,역)商)을 농서도위((농,롱)西都尉)로 삼고 주가(周苛)와 함께 서북으로 보내시어 농서((농,롱)西) 북지(北地) 상군(上郡)을 모두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특히 북지에는 옹왕 장함의 아우 장평이 둥지를 틀고 있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한왕도 거들었다.
“역상을 농서도위로 올린다면 주가도 마땅히 벼슬을 올려줘야 하지 않겠소? 주가는 지금까지 내사(內史)로 이 폐구성을 에워싸고 있었으나, 이제 역상과 함께 떠나는 마당이니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는 게 어떻겠소?”
그리고는 그날로 역상과 주가를 불러들여 각기 새 벼슬과 봉호를 내린 뒤 서북을 평정하러 보냈다. 한신은 성안의 장함이 보란 듯이나 역상과 주가에게 군사를 갈라주어 떠나보내고 다음날로 폐구성을 치게 했다.
폐구성은 옹왕이 된 장함이 도읍을 삼을 때 성벽을 높이고 허술한 곳을 고치게 하여 옹(雍) 땅에서 가장 굳고 든든한 성이 되어 있었다. 거기다가 농성의 주력이 되는 것은 오래 장함을 따라다니며 많은 싸움을 겪는 동안에 사납고 날래진 군사들이었다. 그들이 장함과 함께 성안의 군민을 다잡아 죽기로 싸우니, 거기까지는 자리를 말듯 밀고 온 한군의 기세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한군의 맹장들이 저마다 앞 다투어 성벽을 기어오르고, 5만 군사가 화살비와 바위 우박을 무릅쓰고 그 뒤를 따랐으나 성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닷새가 지나도 성은 떨어지지 않고 장졸만 상하자 한왕 유방이 다시 걱정이 되는지 가만히 한신을 불러 물었다.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한중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옹 땅도 온전히 평정하지 못했으니 걱정이오. 이곳에서 머뭇거리다 겨울이 깊어져 삼진에서 발이 묶이기라도 하는 날이면 관동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항왕의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늦어도 정월까지는 관(關)을 나가 동쪽으로 갈 것이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우리가 겨울이라 군사를 움직이기 어려우면 적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항왕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몰래 군사를 움직이면 관을 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한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으나, 곧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듯했다. 그날 하루 싸움을 쉬게 한 뒤 장졸 몇 명만 거느리고 진채를 나갔다.
그날 저물 무렵 해서야 진채로 돌아온 한신은 곧바로 한왕의 군막을 찾았다.
“대장군의 낯빛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듯하구려. 그래 낮에 나가 무얼 하셨소?”
한왕이 한신의 표정을 살피며 그렇게 물었다. 한신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은 낮에 폐구 주변 고을을 돌며 지세를 살피고 촌로에게 물어 지리(地利)로 이 성을 떨어뜨릴 방책을 알아냈습니다. 더는 무리하게 장졸을 상하지 않고 장함을 사로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방책이 무엇이오?”
한왕이 반가워하며 물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四. 흙먼지말아 일으키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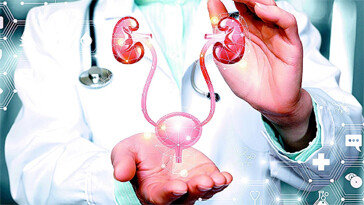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