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왕 항우가 앞장서 오추마를 박차며 크게 외쳤다. 미처 성벽에 붙지 못한 초나라 군사들이 함성과 함께 항우를 따라 팽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인 것은 서문 부근을 지키던 한군이 그새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일이었다.
“어찌하여 한군이 없느냐? 그새 한군이 모두 어디 갔느냐?”
앞장서 내닫던 패왕이 성문을 열어준 성안 백성들을 보고 물었다.
“서문이 열리기 얼마 전에 이곳을 지키던 장수가 장졸들을 모두 거두어 남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급히 뒤쫓으면 따라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패왕의 물음에 문을 열어준 백성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대답했다.
“남문으로 달아나 봤자 그쪽은 우리 서초(西楚)의 가슴이나 배 같은 땅이다. 한군이 기댈 만한 변변한 성조차 없으니 급히 뒤쫓을 것 없다.”
패왕이 그렇게 비웃고는 뒤따라 들어오는 초나라 장졸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어서 성안으로 들어가 유방을 사로잡아라. 듣기로 그 늙은 도적은 과인의 왕궁에서 밤낮없이 술타령이라 하였다.”
하지만 패왕이 이끄는 군사들이 왕궁 부근에서 만난 것은 그새 북문을 부수고 들어온 종리매와 환초의 군사들이었다.
“왕궁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방은 벌써 한 식경 전에 수레까지 갖춰 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패왕에게 군례를 올리기 바쁘게 종리매가 분해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패왕이 그런 종리매에게 물었다.
“북문을 지키던 한군은 어찌되었는가?”
“우리 군사에게 죽고 사로잡힌 자들을 빼고는 모두 동쪽으로 달아났다 합니다.”
“동쪽으로? 당장은 막는 군사가 없지만 그리로 달아나 봤자 적이 발붙일 곳은 없지 않는가?”
“아마도 동쪽으로 노략질 나갔다 미처 돌아오지 못한 저희 편을 믿고 그리로 달아난 것 같습니다. 성안 백성들의 말로는 북문을 지키다 쫓겨 간 한군과 그들을 합치면 다시 10만이 넘는 대군이 될 것이라 합니다.”
“유방은 어디로 갔다고 하던가?”
“남쪽으로 갔습니다. 서문을 지키던 한군이 뒤따라가며 추격을 막아줄 작정인 듯합니다.”
그 말에 패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장졸들을 되돌아보며 자르듯 말했다.
“모두 동쪽으로 가자. 그쪽은 사수와 곡수가 길을 막아 적이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로 잘려나간 한군의 꼬리부터 먼저 토막 낸 뒤 남쪽에 처박힌 그 머리를 부수어 놓는다.”
그러면서 다시 팽성을 나가 동쪽으로 군사를 몰아가는 패왕은 빼앗겼던 도읍을 되찾은 군왕이라기보다는 싸움의 미묘한 기미와 세력의 흐름을 타고 불같이 내닫는 전쟁의 화신이었다. 한(漢) 2년 4월 하순으로, 패왕이 제나라 성양을 떠난 지 닷새 만의 일이었다. 그 사이 패왕은 3만의 군사로 거의 천릿길을 에돌며 56만 대군을 상대로 싸워 다섯 장수의 진채를 짓밟고 세 개의 성을 떨어뜨린 뒤에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팽성을 되찾고 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김도연 칼럼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五. 밀물과 썰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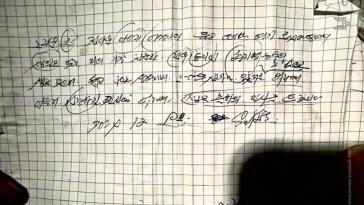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