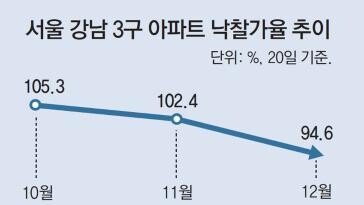2006학년도 대학입시 : 서울대 전형요강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송평인 칼럼
구독
-

기고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