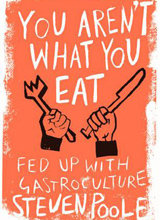
“먹방 열풍은 소비 지상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먹기 위해 사는 이들은 삶의 의미를 엉뚱한 곳, 즉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접시’ 위에서 찾아 헤맨다.”
영국 언론인 겸 문화비평가 스티븐 풀(44)은 2012년 발간한 저서 ‘미식 쇼쇼쇼’(원제 ‘당신은 당신이 먹은 음식이 아니다’)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풀은 이 책에서 한국보다 먼저 먹방 열풍을 경험했고 아직도 제이미 올리버, 고든 램지 등 스타 요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하는 영국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음식이 생존과 나눔의 수단이 아닌 과시, 허세, 우월감의 도구로 변질되면서 음식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 음식에 관한 유행을 만들고 이를 통해 뒤틀린 욕망을 발산하는 ‘푸디스트(foodist)’들만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더 안타까운 건 로마시대 귀족들이 풍요와 권태를 이기지 못해 음식 맛만 보고 뱉어내는 왜곡된 식도락에 집착했던 것과 달리 현재 한국의 먹방 열풍은 상당부분 불황 속 ‘립스틱 효과’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트위터리안 @eunderbar의 지적처럼 ‘면스플레인은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미식놀이’이기 때문이다. 1만 원대 내외인 냉면 한 그릇, 개당 6900원짜리 유명 버거는 저성장과 실업에 신음하는 ‘N포 세대’의 립스틱, 즉 만족도는 높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아 불황일 때 더 잘 팔리는 기호품 아닐까.
현실에 질식당하지 않기 위해 미식을 통해 불안감과 불만을 발산하는 행위 자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남과 나를 다르다고 여기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은 먹는 일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애써 만든 음식이 식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렌틸콩, 퀴노아, 아사이베리, 아마씨, 파인애플 식초 등의 유행 음식을 좇느라 밥 한 끼의 숭고함과 고마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식탁 앞 풍경이 무슨 치유와 위로가 된단 말인가. 미식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소셜미디어가 시시각각 전해주는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이라 착각하며 사는 동안 우리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정민 디지털통합뉴스센터 차장 dew@donga.com
이슈&트렌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기자의 눈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변종국의 육해공談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이슈&트렌드/이서현]‘사과’의 유통기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8/08/79614296.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