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언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스스로의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지면을 외부 인사들에게 할애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일보는 민족의 정론지로서 항상 올바른 논조를 유지하려고 애써왔다. 특히 ‘백지광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동아일보는 하나의 신화였다. 지금도 나는 그 시절의 열정을 기억한다. 한 용감한 저항언론을 돕기 위해 힘없는 국민이 조금씩 보낸 돈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조그만 박스광고들. 그때 동아일보를 펼쳐들면 나는 잉크냄새가 꽃향기처럼 느껴졌다.
우선 동아일보의 편집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다.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단정하고 조심스럽다. 아마도 선정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인 듯한데, 그래도 너무 조심스러워 답답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뭔가 망설인다는 느낌, 틀리기 싫어 주춤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인상은 사진 사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23일자 미국 컬럼바인 고교 총기사건 피해자 장례식 사진에서는 어떤 정서적인 감응력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편집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점에서보수적이라는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뚜렷한 신조를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 편집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박스가 너무 많아 신문을 읽어나가기가 힘들다. 읽기의 흐름이 뚝뚝 끊긴다. 하도 박스가 많으니까 지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박스 기사를 변별적으로 읽을 수 없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방은 잔뜩 있는데 집 모양이 그려지질 않는 형국이다.
20일자의 ‘번역문제’ 특집은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기획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추세가 내용도 없이 문화적 허영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세계화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번역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느리더라도 정공법으로 치고 나가기.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얄팍하게 그때그때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실용적인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적 취약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기획은 그간 ‘번역’하면 으레 나오는 ‘문학번역’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홍보물, 안내 표지판까지도 문제삼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외국의 사례를 곁들인 것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같은 날짜의 ‘서현의 거리읽기’도 괜찮았다. 일상과 문화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산책’ 기획을 통해 대중의 문화의식이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접근방식이 좀더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었으면 좋겠다. 산책하면서 동시에 사색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2일자 박상륭 인터뷰 기사는 모처럼 어려운 문학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그러나 좀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는 없었을까. 본격적인 평론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정란(시인·상지대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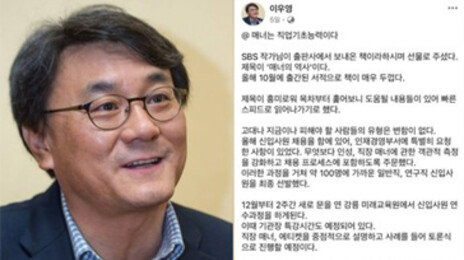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美 작은정부십자군 “저항 세력에 망치가 떨어질 것”[횡설수설/김승련]](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48.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