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나는 그들 부부의 사연을 무척 궁금히 여기면서도 지나치리만큼 진지하고 경직된 그들의 영업 태도에 주눅이 든 나머지, 전에 무얼 했으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고 차마 물어볼 엄두를 못냈다. 다만 부부중 한쪽이 처자식 나 몰라라 알코올에 중독된 채 지하철역 같은데서 신문지 덮어쓰고 드러누워 노숙자 노릇하지 않고, 다른 한쪽이 못난 남편과 어린 자식들 내팽개친 채 어딘가로 출분하지 않은 것만도 남의 일 같잖게 고맙게 생각될 뿐이었다. 갑자기 달라진 삶에 어렵게 도전하는 그들 부부의 용기와 각오가 가상스러워 아내와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단골 노릇을 자청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맛이 형편없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붕어빵이 아니었다. 생밀가루 냄새가 펄펄 나는 풀범벅이거나 돌처럼 딱딱한 밀가루구이에 지나지 않았고, 팥소의 단맛 또한 매번 들쭉날쭉이었다. 아내의 품평에 의하면 떡볶이 역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그들도 자기네 솜씨를 익히 아는지 우리가 들를 적마다 제풀에 미안해 하고 계면쩍어 하는 낯꽃을 감추지 못했다.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들 부부의 솜씨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날로 향상되었다. 붕어빵 본연의 바삭바삭하고 달큼한 맛을 제법 갖추기 시작했고, 떡볶이도 매움하면서 농익은 감칠맛이 나는 정상적인 상태에 얼추 근접할 정도가 됐다. 화학실험이라도 하듯 보다 나은 맛을 내기 위해 갖가지로 진지하게 시도하는 그들 부부의 학구적인 노력이 무척 돋보이는 한때였다. 어느 정도 솜씨에 자신이 붙자 집에 남았던 부부의 입들도 트럭을 따라나와 어설픈 미소와 함께 손님을 상대로 한두마디 말도 건넬 만큼 늘품이 생겼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부부의 행상 트럭에는 난데없이 커다란 방이 붙었다. 큼직큼직하게 쓰인 검은 글씨들을 담은 하얀 종이가 겨울바람을 맞아 펄럭펄럭 부대끼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뭐라 시비라도 걸었나. 그 방을 보며 우리 부부는 단지 가벼운 눈짓만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데도 그 붕어빵장수는 자청해 우리 부부를 향해 자신의 남다른 포부를 피력하는 것이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기필코 전세계를 통틀어 최고로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어내고야 말리라고, 생전 막일이라곤 해본 경험이 없을 듯 싶은 지적 용모의 그 사내는 마치 신앙을 고백하는 투로 강조해 말하는 것이었다. 곁에서는 그의 아내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향해 신뢰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벌써 1년 전 일이다. 낙엽이 흩날리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니까 작년 요맘 때 그 행상 부부가 절로 생각난다.
그들은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우리 아파트 근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아내와 나는 이따금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화제로 삼곤 했다.
세계 최고의 붕어빵은 결국 포기한 것일까. 가족 중 누가 심한 병에라도 걸린 것일까. 아니면 더 좋은 목을 찾아 영업장소를 옮겼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달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실업 상태를 벗어난 탓일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지내든 간에 아무쪼록 그들 부부가 건강하기를 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겠다던 그때의 그 초심이 지금도 한결같기를 바란다. 남들 눈에 아무리 하찮아 뵈는 일일지라도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는 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성취임에 틀림없으니까.
윤흥길<소설가>
PD한정석 >
-

사설
구독 806
-

이주의 PICK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PD한정석의 TV꼬집기]'북한'이라는 이름의 스펙터클 소비재](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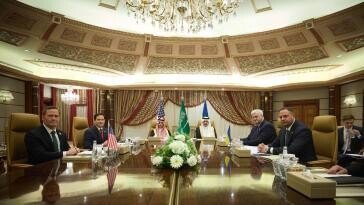

![[사설]“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88902.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