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의 기원’은 내게만 중요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초판으로 모두 1250부를 찍었는데 첫날 거의 모두가 팔려 곧바로 재판 편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제2판은 같은 해 12월 9일에 3000부가 출간됐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개념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던 때였다.
학문의 역사에서 다윈의 자연선택론만큼 혹독한 시련을 거친 이론이 또 있을까 싶다. 우리네 삶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오해가 이해를 앞서고 말았다. ‘종의 기원’이 출간되자마자 사람들은 다윈이 동물원 철책 안에 앉아 있는 원숭이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줄로 오해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이를 테면 침팬지가 진화해 우리 인류가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침팬지와 인간이 그 옛날 공통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할 뿐이다.
현대생물학은 DNA의 변화 속도를 거꾸로 계산해 침팬지와 인간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600만년 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구의 역사 46억년을 12시간으로 놓고 보면 11시59분을 훌쩍 넘긴 때였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짧은 15만년 내지 25만년 전의 일이고 보면 우리 인간은 실로 순간에 ‘창조’된 동물이다.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그저 1% 남짓 다를 뿐이다. 자연계에서 우리들만큼 가까운 사촌을 찾기 쉽지 않다. 우리는 흔히 침팬지와 고릴라 그리고 오랑우탄 등을 저만치 한데 묶어 놓고 우리와 사뭇 다른 털북숭이 영장류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과학적인 분류 기준에 따르면 침팬지는 고릴라보다도 우리와 더 가깝다. 우리는 애써 침팬지와 고릴라를 나란히 세우려 하지만 고릴라가 볼 때는 침팬지와 우리가 한 통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침팬지와 일명 ‘피그미 침팬지’라 불리는 보노보,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모두 침팬지 가족이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요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종족 보존을 위하여’ 또는 ‘종족번식 본능’ 등의 표현에 끈질기게 남아 있다. 이른바 자연선택의 단위 또는 수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개념이다. 다윈에게 있어서 자연선택은 의심의 여지없이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개인의 이득과 집단의 이득이 상충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속집단을 위해 희생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자기 군락을 공격하는 적의 몸에 침을 꽂고 장렬한 최후를 맞는 꿀벌의 경우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비록 자기 몸속의 유전자는 희생되지만 가까운 친지들의 몸속에 있는 보다 많은 유전자들이 후세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12월 5일이면 우리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35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그 헌장을 외기 전까지 나는 내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물론 나만 그랬던 것은 아니리라. 이 같은 헌장들의 다분히 선동적인 구호는 집단의 이득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러나 산아제한 교육과 억제정책 덕분에 정작 출산율이 떨어지자 이제는 ‘역사적 사명’까지 들먹이며 여성들에게 출산의 희생을 강권하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민교육헌장의 사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듯싶다. ‘종의 기원’과 국민교육헌장 사이에서 엄청난 눈높이의 차이를 느낀다.
최재천 서울대 교수·생물학
생명과의 대화 >
-

프리미엄뷰
구독
-

여행의 기분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생명과의 대화]최재천/'비극의 쳇바퀴' 인간은 멈출 수 있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12/10/690940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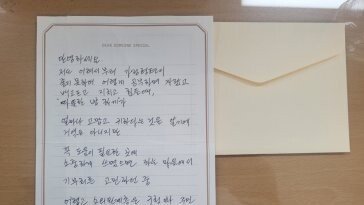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