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같은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경고를 하달했다고 한다. 이 경고가 나온 데는 본보가 18일자 A1면에 ‘미국, 주한미군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현대화 비용 한국측에 부담 요구’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외교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이 분야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의식을 강조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무리한 내부 단속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억울한 희생자만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감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 ‘기밀 누설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해당 기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누가 (그 기밀을) 줬느냐”는 것이다.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발상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기자생활 동안 “이 기밀을 줄 테니 신문에 내시오” 하는 공무원은 만나 보지 못했다.
기사는 ‘퍼즐 맞추기’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조그만 단서와 힌트들이 기자들의 땀으로 엮어 특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대외비나 국가기밀이 언론에 보도돼도 누가 ‘누설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취재 보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누설자 색출’은 결국 해당 기자의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들추거나 평소 친했던 사람을 찾아 추궁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간부는 “억울한 의심을 안 받으려면 호적이나 학적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고 냉소했다.
정보를 ‘지키는’ 정부와 ‘캐내는’ 언론의 긴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언론의 특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 눈을 감은 채 파면 위협을 남발한다면 가뜩이나 의기소침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부형권 정치부 bookum90@donga.com
기자의 눈 >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지금, 이 사람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0/130602757.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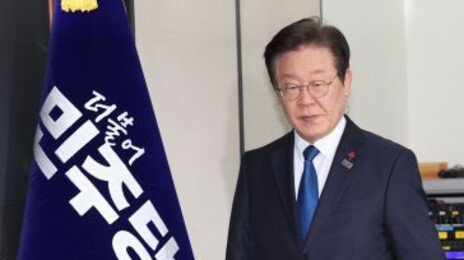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