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성 예찬’에서 빌렘 플루서가 던지는 물음이다. 플라톤 이래로 철학자들은 참된 현실을 가상이라는 거짓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디지털 문명은 이 전통적 패러다임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날 가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아바타를 꾸미는 데에 현실의 돈을 지급하고, 거금으로 사이버 섬을 구입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만화 영화 속의 건축물을 지어주는 건설회사도 있다. 아니, 이전에 우리의 일상을 채워 온 모든 제품들을 보라. 그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던 상상이 밖으로 나와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반면 현실은 가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플라톤 자신도 현실은 가상이며, 참된 현실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현실이 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허깨비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재는 ‘원자’라고 했다. 세계란 원자의 배열이 우리의 감각에 만들어낸 가상이라는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 위의 영상들은 점멸하는 픽셀(pixel·picture element·화소)이 만들어낸 가상이다. 그럼 모니터는 어떤가? 키보드는? 아니, 그것을 두드리는 내 손은? 현대과학은 세계의 모든 게 미립자의 배열이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하여 플루서는 가상과 현실의 차이란 그저 ‘해상도의 차이’라고 말한다.
구석기의 원시인들은 풍만한 여인의 조각을 만들고, 동굴의 벽에 그림을 그렸다. 현실의 바람을 가상으로써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술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들은 그림이 아니라 문자로 세계를 기술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역사’가 시작된다. 이제 인간은 주술적 상상력을 버리고 대신 철학이나 과학의 추론적 사유를 발전시키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런 문자문화의 끝에 와 있다. 문자의 시대는 가고, 다시 영상의 시대. 하지만 이 영상은 과거의 것과 달리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다. 조각(3차원)→벽화(2차원)→문자(1차원)→픽셀(0차원). 똑같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새로운 전자영상은 과거의 조각이나 벽화보다 추상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원시인들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다시 찾아온 이미지의 시대도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시인들의 것이 ‘주술적 상상력’이라면, 현대인의 것은 ‘기술적 상상력’이다. 원시인들은 자신들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을 단지 바랐다면, 기술로 무장한 현대인은 실제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
컴퓨터는 세계를 0과 1의 픽셀이라는 미립자로 분석(analyse)할 뿐 아니라, 그렇게 분석된 입자들을 종합(synthesize)할 수 있다. 컴퓨터로 무장한 인간은 이미 있는 세계를 그대로 인식하는 주체(subject)가 아니라, 제 꿈을 앞으로(pro) 던져(ject) 아직 없는 세계를 창조하는 기획(project)이다. 플루서의 ‘피상성 예찬’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인간의 존재론이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미학
21세기 신고전 50권 >
-

고양이 눈
구독
-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구독
-

동아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책 읽는 대한민국/21세기 新고전 50권]옛그림 읽기의 즐거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8/18/6952138.1.jpg)
![[사설]손가락 잘리고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당한 18개월 영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49.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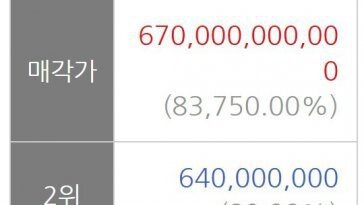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