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로부터 18일 뒤인 6월 11일 김 씨는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발탁돼 올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5월 29일 퇴임할 때까지 2년간 정책 실세(實勢)로 각인돼 왔다. 그는 작년 7월 3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고, 올해 5월 2일엔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했다. 오래도록 김 씨를 따라다닐 어록들이다.
김 씨와 함께 일했던 학자그룹과 대통령 참모그룹 사이에서 김 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도 나온다.
“지방선거 며칠 뒤에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나는 확신한다’고 했던데, 그는 무슨 확신범 같은 사람은 아니다. 대통령 생각을 대신 옮겨 본 거 아니겠는가. 그는 진보적이거나, 전교조에 동조해 온 사람도 아니다. 교육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부리기 쉬운 사람이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다. 생각도 건전하고, 조리 있고, 설득력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생각을 ‘오버’해서 표현하는 면이 있다. 대통령이 ‘욱’해서 너무 나가면 좀 잡아 줘야 되는데 한 수 더 뜨는 게 탈이다.”
한때 ‘노무현의 교수들’의 멤버였던 어느 인사는 대통령의 ‘쌍두(雙頭) 정책참모’로 꼽혀온 김 씨와 이정우 씨에 대해 “학문적 소신을 폈다기보다는 대통령 코드를 읽고 비위를 맞추는 소질이 남달랐다”고 말했다. 요컨대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이 험한 삶 속에서 체득한 세계관 국가관 사회관 인간관은 현 정권의 경제, 부동산, 교육, 언론 정책 등의 밑그림이 됐고 김 씨와 이 씨는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재주가 돋보였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가슴속에는 지배층 중심의 역사에 대한 반감, 넓은 의미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고, 예컨대 그것이 교육정책에서 ‘학벌 기득권층’ 공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씨가 교육부총리를 맡고 나면 다소 ‘오버액션’형, 돌격형으로 교육정책을 주도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면 경제, 부동산 정책에서처럼 교육에서도 마찰음과 파열음이 더 커질 것이다. 그가 수백만 명의 ‘국민 교육전문가’보다 교육에 깊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대통령은 이해찬 조기숙 이병완 씨 등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거나 “경제는 잘하고 있는데 민생이 어렵다”며 국민 속을 뒤집어도 꾸중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한번 붙으니까 좋더구먼” 식의 코멘트는 가끔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전직 참모는 “그래도 부하들이 언행을 조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짚었다. 반면 다른 전직 인사는 “대통령이 비판 세력을 깨부수는 부하를 좋아하니까 경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씨가 그 경쟁에서 초연해질 조짐도 아직은 없다.
어제 경제부총리로 내정 발표된 권오규 씨는 김 씨처럼 크게 오버한 흔적은 별로 없다. 권 씨가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데 대해 대통령은 높은 점수를 줘 왔다고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으로 옮겨 간다는 변양균 씨는 젊은 관료시절엔 잘 드러나지 않던 ‘투사형 충신’의 모습을 언뜻언뜻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아무튼 김, 권, 변 씨의 공통점은 ‘대통령 손바닥 위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선거 민심에 꿈쩍도 않는 ‘회전문 개각’일 뿐이다. 누가 어느 자리에 있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별반 달라질 게 없다.
며칠 전 ‘구시대 장관’이 사석에서 말했다. “세종대왕 밑에는 집현전 학사가 있었고, 연산군 밑에는 채홍사가 있었다.”
배인준 논설실장 injo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배인준칼럼]김 위원장의 남녘 충복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6/07/17/697721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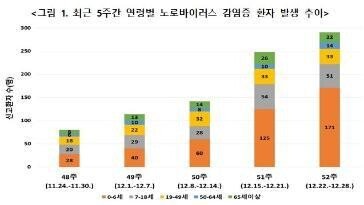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