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는 전번에 적은 것처럼 오늘의 젊은이들이 징후를 느끼지 못하는 ‘절제의 나사가 빠진 사회’의 작태에 대한 진단이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뤄 볼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나라가 망하는 다양한 길’에 관한 예후(豫後)이다. 우리들은 망국의 일상적 현실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일본 제국도 망하는 모습을 가까이 목격했다.
흔히 ‘영국의 세기(Pax Britanicas)’라 일컫는 19세기에 대해 20세기는 ‘미소의 세기(Pax Russo-Americana)’라 일컫고 있다. 그러나 지구를 양분하고 있던 동서 대립의 한쪽 대들보 소련조차 허망하게 망해 버리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다.
독일 일본 소련 흥망사의 교훈
더욱 놀라운 일은 한 나라가 망하는 데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다.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가 했던 일본 제국이 망한 데엔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77년 걸렸다. 세계 최강의 핵무장을 하고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소련이 망한 것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73년 만이다.
‘천년 제국’을 꿈꾼 나치스 독일은 12년 만에 망했다. 히틀러 독일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보다 더 넓은 땅덩어리를 그들보다 더 빠른 시일에 정복한 히틀러 독일은 유럽 대륙 무적의 강자였다. 미국과 전쟁을 했던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유라시아의 초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차례로 거꾸러뜨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선 전승국의 반열에 끼어든 강대국이었다.
그러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내후년이면 갑년을 맞게 된 대한민국이 이제 반석 위에 올라앉았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하고 ‘주체 연호’까지 쓰는 천황제적 ‘신성 평양 제국’도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과거 동유럽 공산권의 한 외교장관이 쓴 회고록을 보면 하루는 그곳 북한대사가 찾아와 김일성의 동유럽 방문 의전에 관해 협의할 때 기립하지 않고 앉은 채 ‘위대한 수령’ 말을 꺼낸 사실을 극비에 부쳐 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때 비에 젖은 현수막의 ‘친애하는 지도자’ 그림을 품에 안고 눈물 흘리던 북한 미녀 응원단의 모습을 떠올려 봤다. 그런 일이 조금도 생소하지 않은 우리 세대는 일제 식민지 체험을 통해 ‘영도자 신앙’에 일종의 ‘면역 항체’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덴노(天皇)는 ‘아라히토가미(現人神·사람으로 나타난 신)’, 신이 다스리는 일본은 ‘신코쿠(神國=신국)’. 그렇기에 일찍이 몽고 대군이 일본을 침범하려 하자 ‘가미카제(神風=신풍)’가 불어 침략군을 물리친 일본은 불멸의 ‘신국’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어린 나이에 그걸 믿었다. 그러나 얼마 있다 ‘가미카제’가 자살 특공 비행대의 이름이 되더니 ‘신풍’이 지켜준다는 ‘신국’은 헤프게도 망해버렸다. 해방 후 어느 잡지에 맥아더 장군을 예방한 ‘아라히토가미’가 ‘태평양의 시저’ 장신의 맥아더 옆에 단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처음 본 감명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
자주국방? 6·25 때 미국 지원군이 오지 않았으면 남한은 1950년 여름에 망했고 중공 의용군이 안 왔으면 북한은 그해 가을에 망했다.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는 다 망할 수가 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데엔 다양한 길이 있다. 앞으로 그걸 공부해 써 보아야겠다. 어쩌면 그를 위한 가장 좋은 사례 연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본보 객원大記者
최정호칼럼 >
-

고양이 눈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최정호 칼럼]‘춘향전’의 중국화와 ‘동북공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6/11/02/698759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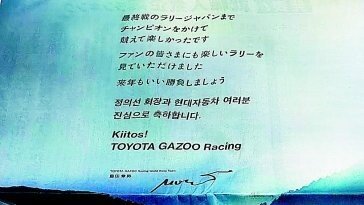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