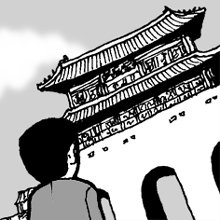
▷그마저도 6·25전쟁 때 폭격을 맞아 돌로 된 부분만 남고 소실됐다. 현 위치에 다시 세워진 것은 1968년의 일이다. 당시도 복원은 복원이었다. 다만 지금은 철거된 조선총독부 청사의 중심축에 맞춰 짓느라 원래 자리에서 북으로 14.5m, 동으로 10.9m 물러난 곳에 자리 잡았다. 석재는 그대로 옮겨 사용했으나 문루(門樓)는 나무가 아닌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지금 보면 어색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방식이었던 셈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이 ‘진짜 복원’이라고 강조한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데다 문루도 목재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원형을 되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원다운 복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른 곳에 남아 있는 정조대왕의 글씨를 집자(集字)해 광화문 현판을 바꾸겠다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발상은 박정희 시대를 묻어 버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1960년대에 지은 광화문도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될 것이다. 그걸 허물고 지으려면 훨씬 훌륭한 문화재를 만들 능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광화문이 헐리기 직전인 1922년 친한파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광화문을 잃으면 서울의 중심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은 서울의 역사적 심장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미 광화문 뒤편에 새로 건축된 궁궐들은 그에 걸맞지 않게 빈약한 느낌이다. 옛 광화문과 비슷한 ‘모조품’을 짓는다면 TV 세트장과 다를 바 없다. 이 시대를 대표할 ‘새 광화문’을 지을 역량이 정부에 있을까.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횡설수설 >
-

밑줄 긋기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이진영]“尹과 골프 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기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9/130537657.2.jpg)
![“워크 타파”… 美 문화 전쟁 본격 불붙다[글로벌 포커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3844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