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과 대의명분,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정당(민주당)으로 자부심을 지켜 간다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2002년 10월 17일) 1년 24일 뒤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뭐가 옳으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정치를 해 왔습니다.”(2007년 1월 30일)
法治아닌 人治가 民主망쳐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훑어보면 대의명분도 편의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엊그제는 대통령이 이행하는 역사적 과제가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자신의 이미지와 객관적 정치 상황, 독재시대에 형성된 불신과 대결의 문화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외국에 가면 민주주의 지도자로 칭찬받는다고 했다.
국빈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시비할 간 큰 외국인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 ‘수구언론’도 아닌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2006년 아시아의 끔찍한 해’라는 올해 신년호 기사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이 끼여 있다. “한국과 대만 필리핀 태국의 정치 엘리트는 정당한 과정, 법치, 민주주의의 근본 룰에 대한 강한 헌신이 없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우리만의 비극은 아니라는 점이다. 1987년의 민주화운동이 집권 386의 투쟁만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힘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시아와 동유럽, 남미 곳곳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리더가 ‘선거를 한다는 것’만 뺀 나머지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느라 바쁘다. 지난주 ‘신흥 민주주의를 위한 글로벌 포럼’을 주창한 대만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비판언론 탄압, 충성부대 동원, 자의적 경제정책 등 이들의 무기도 낯익다.
먹고살 만해지면 사람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고 알려져 왔다. 세계 역사는 공산 유토피아로 완성된다는 마르크스주의가 소련 붕괴와 함께 끝났다고도 했다. 이제 ‘21세기 사회주의’ 종주국이 된 베네수엘라는 들먹이기도 싫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수행한다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뺨치는 부동산과 기업 교육 정책 등으로 개인의 자유를 옥죄니 진짜 민주주의는 울고 갈 판이다. 그것도 방향은 옳다는 대의명분으로 포장해.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왔다며 ‘역사의 종언’을 외쳐 스타가 됐다. 그러고는 좀 민망했던지 지난해 ‘역사의 종언 이후’란 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두 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성패는 각 나라의 문화에 달렸다고 변명했다. 자유보다 평등을 원했던 2002년 한국의 문화가 오늘을 잉태했다는 얘기다.
그때는 그때라고 치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이 자유보다 평등, 특히 결과의 평등이 옳다고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잘살 수 있는 나라는 기대하기 힘들다. 공산당이 일당독재하는 중국과 베트남조차 경제자유화로 돌아선 것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평등만 받들어선 빈곤의 평등뿐임이 입증된 지 오래다.
‘배부른 詐欺’엔 안 속는다
그래도 뭐가 옳으냐는 대의명분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공직자나, 일하지 않고도 ‘운동’까지 하며 먹고살아 온 이들이 혼자 하는 궁리라면 상관없다.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을 분석한 새뮤얼 헌팅턴은 정화(淨化)·참여·박애 같은 대의명분을 휘두르는 정권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빠지기 십상이라고 했다. 더구나 사오정(45세 정년)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도 모자라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이란 신조어가 나도는 현실이다. 허우대 멀쩡한 백수가 “자장면 반값에 안 되겠니?” 하고 사정하는 나라에선 어떤 대의명분도 배부른 소리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새 비디오 >
-

이주의 PICK
구독
-

사설
구독
-

박중현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새비디오]「단짝친구들」/청춘남녀의 사랑과 배신](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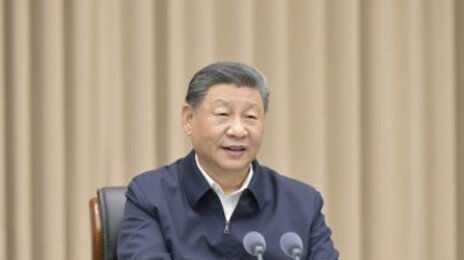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