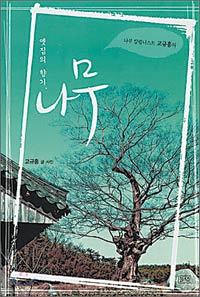

흔히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들 말한다. 삶이 고단하거나 버겁다고 느낄 때 더 그렇다. 우리 눈에 비친 나무는 항상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무의 한살이를 꼼꼼하게 지켜본 사람이면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무도 제 딴에는 힘겨운 삶의 굴곡과 매듭들을 힘겹게 그러나 당당하게 헤쳐 가며 살고 있다. 나무는 알면 알수록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게 나무의 삶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방법을 묵묵히 가르친다. 그래서 나무는 특히 고맙다.
저자의 차를 타고 함께 천리포 수목원에 간 적이 있다. 자그마한 체구의 그에게 덩치 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크게 느껴져서 날렵하고 가벼운 차가 낫지 않으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온 나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야 하고, 때론 거친 들판과 좀처럼 사람을 들이지 않으려는 자연의 숨은 곳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차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10년은 탈 만한 거리를 이미 훌쩍 넘기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불러냈는지 궁금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옆에서 보기에는 그랬다) 온 나라를 뒤지며 나무 순례를 하는 걸 보고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식물학자도 아니고 그 방면에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잠깐 머리 식히는 일이겠거니 했던 일이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서너 해를 넘길 때쯤 돼서야 그가 새로운 주제에 삶을 송두리째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땅의 늙은 나무들에 대한 그의 순례는 구도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나무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겸손함에서 온 것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은 옛 건축물과 함께 살아 온 나무들을 직접 보고 어루만지면서 그 감동적인 느낌을 옮겨 놓은 나무와 역사 답사기다. 가장 한국적인 정원으로 평가받는 전남 담양군 소쇄원의 소나무, 19세기 조선 최고 지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충남 예산군 추사 김정희 고택의 백송(白松), 이 땅의 마지막 주막인 경북 예천군 삼강주막 옆의 회화나무 등등.
관념으로 쓴 글이 아니라 힘겹게, 그리고 여러 번 찾아가 직접 보고 느끼고 익혀 두었던 게 따뜻한 그의 시선으로 되살아난 것은 분명 고마운 일이다. 그는 나무가 있어 행복할 것이다. 또 나무는 그가 있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속내를 전해 주는 책이 있어 우리는 함께 행복하다.
김경집 가톨릭대 교수 철학
서경석 >
-

오늘과 내일
구독
-

경제 Inside Out
구독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서경석의 PC사랑]「윈도」열고닫고 『말문트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0241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