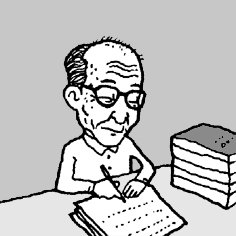
▷그는 1970년대 중반에 절필을 선언했다. “어느 날 보니 내가 전보다 못한 글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직을 정년 1년여 앞두고 그만뒀다. 태생적으로 순수함과 겸손, 초탈함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다들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볼 일은 아니다. 그의 인생항로는 순탄치 않았다.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열 살 때 어머니를 여읜 뒤 식민지 지배와 전쟁 같은 현대사의 굴곡에 부닥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가 등단했던 1930년대 초는 식민지 지배하에 현실 참여적 문학과 순수 문학이 대립하던 시절이다. 여기에서 그는 서정(抒情)과 순수의 길을 택한다. 그의 글에 아릿한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은 엄혹한 현실을 딛고 얻어 낸 순수였기 때문일 터이다. 문학의 역사에서 ‘현실’과 ‘순수’는 반복된 적이 많았다. 현실 참여파가 한동안 힘을 얻고 나면 다음에 순수파가 돋보이는 식이었다. 이념 과잉과 물질 만능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그의 글에서 더 진한 감동을 얻는지 모른다.
▷1910년 태생인 그는 “너무 오래 살아 민망하다”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피천득 선생이 살아 있어요?’ 하고 묻는 말이 짐이 되었던 듯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국민적 사랑을 받는 문인 가운데 100세를 넘긴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그가 100세를 불과 3년 남겨두고 타계한 것이 못내 아쉽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광화문에서
구독
-

송평인 칼럼
구독
-

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