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은 그 어떤 사건으로도 기록되지 않는다. 비와 바람과 흔들리는 잎사귀와 청명한 햇빛은 저 홀로 방만하게 창궐하다 스스로 사멸한다. 그 누구의 고통이나 기쁨 따위에도 가을은 무심하다. 하강하는 바람의 온도를 따라 그저 마음의 깊은 자리가 욱신욱신 쓰라려 올 뿐,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이미 마음을 떠난 지 오래다.
하지만 변화하는 공기는 연방 사람을 찌른다. 내용 없이 모종의 기미(機微)들만 늘어선 계절의 초입에서 시인이 뭔가를 계속 끼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탓이다. 침울한 가슴은 늘 세상만사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쉼 없는 본능처럼 계속 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말들. 또는, 의미를 고의적으로 상실한 말들의 사사로운 흔적과 처연한 시늉들. 그것들이 ‘불쌍한 실내극’처럼 내면의 텅 빈 여백을 죄여 올 때, 이 뻔하게 통속적인 도시가 새삼 ‘놀라워라’.
이준규는 말의 조각난 뼈들을 긁적여 괴이한 언어적 도해로 풀어내는 시인이다. 그의 시는 일상 화법, 나아가 한국어 일반 구문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와 무시 속에서 자족적으로 씌어진다. 전혀 거창하지도 의미심장하지도 않은 사물과 말들이 수평적으로 이어지면서 기묘한 효과를 낳는다. 모종의 추상화 같기도 하고 애당초 음계 따위 파괴해 버린 미니멀리즘 음악 같기도 하지만, 계속 들여다보면 결국 그림도 음악도 아닌 그저 언어로 긁적여진 여지없는 시일 따름이다. 그것도 그 어떤 언어적 세공술의 결과물보다 더 시의 본령에 가까운 원초적인 몸짓에 가깝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는 잎사귀’처럼 미세하게, 그러면서 ‘비껴 달아나는 침묵’의 모가지를 꺾어 숨은 말을 토해 내려는 듯 집요하게 이 거창한 세계가 놓치고 있는 기미들을 포착하는 언어들. 정작 그것들은 완결된 형상의 모사나 일관된 사유에 관한 토로가 아니었기에 육체의 첨단에서 자연 발생한 신음 소리를 닮았다. 때로 끔찍하고, 자주 처연하다.
그 처연한 가을의 초입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한다. ‘슬픔은 어떻게 오는가 묻지 않았지만/풍광을 잡으러 떠나는 헛손질에서 숨이 곧 멎는다’고.(‘가을이 또’ 중에서)
강정 시인
서경석 >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서경석의 PC사랑]「윈도」열고닫고 『말문트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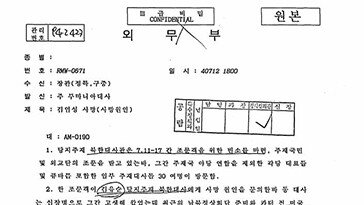
![“마라톤, 근육 운동 병행해야 오래 즐겨요”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9937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