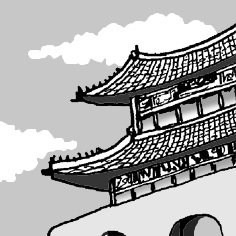
▷일제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헐어 건춘문 북쪽(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자리)에 옮겨 놓았다. 새로 지은 총독부 청사에서 육조거리를 바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의 미술을 사랑했던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천연과 인공의 훌륭한 조화가 몰이해한 자들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 …그 바로 앞에 이들 동양의 건축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방대한 건축, 즉 총독부가 지금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 같은 분노와 슬픔이지만 설의식의 민족적 분노와는 달라 건축적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데 대한 질타에 그쳤다.
▷경복궁이 조선의 법궁(法宮)이었던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모두 일본 때문이다.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탓에 이후 왕은 주로 창덕궁에 머물렀다. 조선 말기 대원군이 중창했지만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면서 다시는 국왕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위협을 느낀 고종은 열강의 공관으로 둘러싸인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했고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도 그곳에서 이뤄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광화문을 복원했으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데다 정확히 제자리도 아니어서 목조 건물로 다시 짓기 위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중건 때의 흔적뿐 아니라 창건 때의 자취까지 나와 이 유구(遺構)의 보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다. 무슨 긴 말이 필요할까. 문화재는 보존이 첫째고 복원은 그 다음이다.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이주의 PICK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양치기 소년이 된 교육부총리[오늘과 내일/장원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58807.1.thumb.jpg)
![“한식과 어울리는 K술 알고파”… 佛 와인박람회서 주목받은 ‘막걸리-소주’[글로벌 현장을 가다/조은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5881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