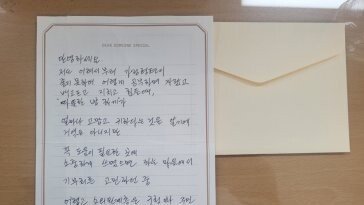세계 수준에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과학계의 쾌거들이다. 연구 여건이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척박한 수학 화학 같은 기초학문 분야에서 이뤄낸 성취이기에 더욱 값지다. 이런 성과는 우연히 또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국가석학’ 사업 등 제도적 지원도 있었지만 밤늦도록 연구실의 불을 밝힌 결과다. 강 교수는 “TV를 볼 때조차도 문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200편 발표에 피인용 건수가 3500여 건에 이르러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국가석학이다.
잇따른 낭보는 교수 재임용 및 테뉴어(정년 보장) 심사 강화로 비상이 걸린 한국 대학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경쟁력은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교수진의 역량에서 나온다. 세계 유수 대학들은 교수 역량 및 업적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교수들도 최고 수준의 업적을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대학과 학자들이 늘어나야 대학도 살고 나라 경제도 발전한다.
정부는 대학 연구년(硏究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교수들의 연구년은 ‘안식년’으로 불렸다. 많은 교수들이 연구년에 외국에 나갔지만 새로운 학문을 접하려는 노력보다는 골프와 자녀 영어공부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외국 교수는 연구년에 저서를 펴내는데, 한국 교수는 싱글 골퍼가 돼서 돌아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다.
외국 학자와의 공동연구가 용이한 과학자들이 먼저 학문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선도해야 한다. 정부도 기초과학의 저변을 넓히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제의 비디오 >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건강 기상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