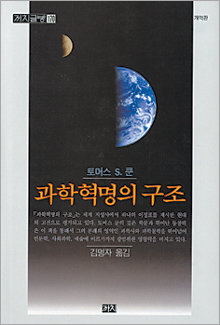
과학은 기존 패러다임 파괴통해 발전
과학은 길고 긴 레이스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연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왔다.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이 과학으로 발현된 것이다. 한 발씩 내디뎌 온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과학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이는 과학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과학은 단순히 차곡차곡 쌓여서 발전하지 않는다. 과학 지식의 발전은 기존 판도를 뒤집는 폭발적인 무언가로 인해 가능하다. 이러한 발전을 저자는 ‘과학 혁명(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분기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저자의 발전 모델에 따르면 과학 혁명은 이전에 통용되는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바뀌는 “비축적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여기서 패러다임은 다양한 의미로 규정되는데, 과학 분야의 기본 이론과 법칙, 개념, 지식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과학을 아우르는 가치관과 과학자들 간에 공유되는 관념까지 일종의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과학 혁명이 오기 전까지 이러한 패러다임은 과학 사회에서 안정된 형태를 띤다. 자연 현상의 본질에 대한 탐구 자체가 이 패러다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시기를 ‘정상 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 유효하던 정상 과학은 한계에 부닥치는 시점을 맞이한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기에 부닥친 패러다임은 붕괴를 맞이하고 그 결과 새로운 정상 과학이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과학 혁명이다. 코페르니쿠스나 뉴턴, 라부아지에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출현은 모두 이런 과학 혁명이란 개념으로 설명된다.
저자의 과학 혁명 개념은 정치 혁명과 비슷하다. “정치 혁명의 목적이 기존 제도를 파괴하기 때문에 기존 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과학 혁명에서도 경쟁하는 패러다임 사이의 선택은 양립 불가능하다.”
이 책은 1962년 첫 출간 당시 그 자체로 혁명이었다. 당시 과학철학은 지식 축적을 통해 진보한다는 귀납주의 관점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쿤 혁명’이라 불린 이 책은 과학은 물론 지식사회 전체의 변천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래서 과학철학을 넘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언어학자 마거릿 매스터먼이 지적했듯 패러다임이란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 그러나 과학 역시 인간의 여타 활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발상 자체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과학 역시 인간의 산물인 것이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비만탈출 >
-

DBR
구독
-

교양의 재발견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비만탈출]어깨-팔 날씬하게…](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