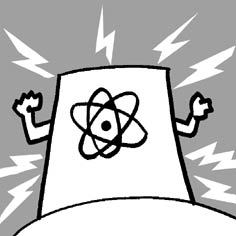
▷역사는 돌고 돈다. ‘악마의 선물’이라며 푸대접을 받던 원자력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때문이다. 태양력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속도는 너무 느렸고, 풍족한 에너지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바꾸기 어려웠다.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원자력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 가이아이론의 창시자인 영국의 제임스 러브록 박사까지도 ‘그린 로맨티시즘’에서 벗어나 원자력에 눈을 돌리자고 주장할 정도였다.
▷원전 르네상스를 가장 반기는 나라는 1980년대 극렬한 반핵운동에도 불구하고 원전 유지 정책을 고수해온 프랑스다. 59기의 원전을 가진 프랑스는 기존 원전의 대체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기씩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열심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중동과 중국, 아프리카를 상대로 원전 수출계약 성사를 위해 뛰고 있다. 미국은 스리마일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지만 기존 원전들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원전발전(發電)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신규 원전 인가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원자력 침체기에도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온 한국은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해외 원전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유리한 고지 앞에 있다.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인 우리나라는 가격은 싸고 운영효율은 높은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한 실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원전 비즈니스에선 기술 못지않게 외교가 중요하다. 원자력 3강인 미국 프랑스 일본이 진입장벽을 높여놓은 데다 한미(韓美) 원자력협정에 묶여 수출에 제약도 적지 않다.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이런 장애를 극복할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하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건강 기상청
구독
-

소소칼럼
구독
-

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