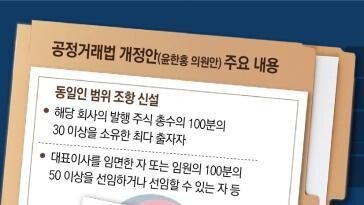《‘서점에서 나는 늘 급진파다. 우선 소유하고 본다. 정류장에 나와 포장지를 끄르고 전차에 올라 첫 페이지를 읽어보는 맛, 전찻길이 멀수록 복되다. 집에 갖다 한번 그들 사이에 던져 버리는 날은 그제는 잠이나 오지 않는 날 밤에야 그의 존재를 깨닫는 심히 박정한 주인이 된다.’ (이태준 ‘책’ 중에서)》
암흑기 대표문인 51인의 맛깔난 산문
근대의 풍경을 반추해보기 위해 당대를 살았던 문필가들의 산문만한 단서가 있을까.
이 책에는 이태준 김기림 채만식 김유정 이광수 이상 백석 등 1920년대부터 광복 전후까지 51명의 문인이 쓴 산문 91편이 수록됐다. 당대의 문필가로 손꼽히던 이들이 문예지 일간지 등에 발표했던 글들에는 문인들의 진솔한 인생관이 녹아 있다.
소탈한 맛과 유머가 생동하는 글뿐 아니라 당대 풍경을 짐작하게 하는 풍속화 같은 산문,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삶의 면면이 숨쉬는 글, 작가의 문학관이나 사상을 담아낸 글 등이다.
책을 읽다 보면 일제강점기를 보낸 이들의 글이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사라진다.
이들의 글 속에 사람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삶이 살아 있다.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였던 김남천의 ‘냉면’ 이란 산문에서는 평안도 출신 작가의 냉면론이 전개된다. 어머니 등에 업혀 있던 어린 시절부터 냉면을 먹기 시작한 평안도 사람들이 길사 경사 흉사를 막론하고 냉면을 상에 올리고 화가 치밀거나 상심할 때도 술 대신 냉면을 찾는다. ‘나는 그의 귀여운 발이 멀리 갔다가 나의 집 처마 아래 참새처럼 찾아드는 고운 걸음걸이를 한량없이 사랑한다’고 애틋한 연정을 읊는 시인 임화의 산문은 밑줄을 긋게 만든다.
놀라운 점은 반세기 전의 산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괴리감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책만 보면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냉큼 사놓고 한두 페이지 읽은 뒤 방치하는 소설가 이태준의 산문 ‘책’을 보자. 다 읽지도 못한 책을 친구가 빌려 읽고 심지어 평가까지 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끼는 대목에선 웃음이 난다. 먹잇감을 잔인하게 죽이는 고양이의 비윤리성을 증오하다가 그것이 자연의 법칙임을 깨닫는 김동석의 수필 ‘고양이’도 유머가 묻어 나는 끝맺음을 보여준다.
‘정녕코 쥐 잡는 고양이가 밉살스럽거든 고양이를 채식주의자로 만들기에 힘쓰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대의 이상은 불가능에 봉착하는 것이다. 그것은 힘든 일이라고? 인류 역사상 곤란 없이 실현된 이상이 어디 있었던가.’
어린 자식의 병을 계기로 공덕을 쌓지 못하고 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이광수의 ‘참회’나 삼복더위 속에 폐결핵으로 고생하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그리워하는 김유정의 ‘나와 귀뚜라미’ 등에서는 진솔하면서도 소탈한 인간적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 김기림 정지용 등의 문학과 예술에 관한 성찰을 감상할 수도 있다.
나도향 최서해 이상 등 타계한 작가들을 기리며 동료 문인들이 썼던 조사에서는 소소한 술버릇부터 죽음을 앞둔 투병 모습까지 선연하다.
좋은 글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가치와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 이것이 문학의 힘이란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인간 배아 줄기세포 : 찬반-윤리논쟁 >
-

세종팀의 정책워치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