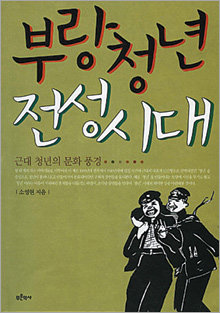
《“이 책은 1900년대 전후에서 1920년대에 걸친 시기에 근대의 대표적 인간형으로 선택되었던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이 불려나오고 만들어지며 분류되어 갔던 구체적 장면들을 둘러본다. 때로 ‘청년’을 만들어 내는 토양에 시선을 두기도 하고 ‘청년’이라는 이름이 지워 버린 흔적들을 더듬기도 하면서, 조각난 장면들을 잇대어 ‘청년’ 시대의 희미한 상을 마련해 볼 것이다.”》
일제하 희망 잃은 청춘들의 삶과 고뇌
서구의 근대 문물이 급속히 쏟아졌던 100년 전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 책은 100년 전 이미 ‘근대적 인간’의 외양을 띠었으나 일제강점이라는 현실 속에서 절망했던 20세기 초 한국의 청년들에게 주목했다.
1923년 최초의 근대 시집을 발간한 김억(1893∼?)이나 소설 ‘임꺽정’의 홍명희가 당시 신종 국제 공통어인 에스페란토를 유창하게 구사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근대 문물의 유입과 일제강점이라는 혼란한 사회 격변기에 나름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했던 청년들의 고민과 일상을 당시 발행된 수많은 인쇄물, 산문, 잡지, 청년 모임들이 펴낸 문집을 통해 생생하게 재구성한 데 있다.
근대적 청년의 등장은 외모와 패션의 변화로 시작됐다. “세비로(남성복의 윗옷을 뜻하는 색코트·sack coat) 양복을 갖춰 입고 맥고모(밀짚 등으로 여름에 쓰는 모자)를 쓰고 단장(短杖·짧은 지팡이)을 들어야 했다. 도회 중심가에 있는 서점에 들어 수입 잡지나 서적을 둘러보고 만년필을 꺼내 뭔가를 끼적여 보기도 해야 했으며…여성이라면 긴 드레스나 양장 투피스 한 벌쯤은 마련해 둬야 했다…활동사진관 구경이나 야시(夜市) 산보에도 익숙해져야 했으며 때로 도서관이나 강연회, 음악회나 문예전람회에도 들어야 했다.”
‘외적 근대화’에 숨은 허영심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다. 구두에 버선을 신고 도심을 거니는 여성은 어설픈 근대화의 우스꽝스러운 부산물로 비난받았다. 1909년 서울 종로에서 궁중요리와 고급 술, 기예를 팔았던 요릿집 명월관을 ‘부랑청년의 집합소’라고 부르는 비난의 소리도 높았다.
외모를 근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상도 근대적으로 변해야 한다. 삶의 변화 속에서 근대 청년의 정신이 탄생했다.
당시 사람들은 근대적 청년은 응당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상실한 국권을 회복하고 사회 개혁과 지식 전파에 나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고 활동사진집이나 요릿집에 가서 노는 청년들을 부랑청년이라고 불렀다. 근대적 학교를 다녀 근대적 의식을 접했으면서도 서양 문화에 익숙했으나 놀기만 했던 청년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부랑청년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고루한 인습에 순응하기 싫으면서도 일제강점이란 절망적 상황에서 근대적 일상을 살아갈 뚜렷한 희망을 잃었던 것이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인 저자는 이들이 일종의 ‘정신적 자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현실을 거부하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한다.
저자의 표현처럼 당시 청년들은 “진지했으며 가난했고 열정적이었으나 때론 전투적이었고 본의 아니게 비열했으며 신랄할” 정도로 복잡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인간 배아 줄기세포 : 찬반-윤리논쟁 >
-

고양이 눈
구독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구독
-

e글e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