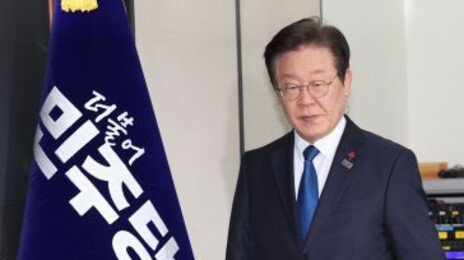‘본격소설’을 쓴 일본작가 미즈무라 미나에의 말처럼 누구나 문장을 쓸 수 있으므로 소설가가 되는 일은 정말 간단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술가에 비해 소설가는 ‘너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하늘의 특별한 소리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 소리는 우연과 우연이 겹쳐 정말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경험할 때나 누군가 소설가인 나를 찾아와 들려주는 신비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무엇에 홀린 듯 써 나가기 시작할 때 소설가라는 자의식이 생기곤 한다. 그런 일은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니 매번 주눅이 든 채 뜬눈으로 한밤중에도 책상 앞을 서성거린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툭 던진 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낯선 여인들 틈에 끼여 여행을 가게 되었다. 떠나면서도 내일 오후까지는 돌아와야 하는데 하고 걱정했다. 한 달 전쯤인가 내가 머무는 캘리포니아대의 일본어센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에 관한 심포지엄을 준비 중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작가 행사에 입장료가 제일 싼 게 16달러나 한담, 하고 투덜거렸는데 그나마도 표를 살 수가 없었다. 그럼 안 가고 말지 했는데 한국어센터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표라며 특별히 입장권을 마련해주었다. 그랬으니 안 가기도 힘들었다.
그동안 작품으로만 알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는 몹시 진지하고, 말도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할 거라는 짐작은 보기 좋게 틀렸다. 어디 가벼운 산책이라도 나가는 차림으로 무대에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사말부터 낭독, 사회자와의 대담까지 거의 두 시간 동안 시종일관 농담을 했다. 오나마나한 자리였을지도 모른다고 속으로는 좀 실망하는데 한 독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왜 글을 씁니까? 툭 내뱉듯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다. 견디기 위해서. 아, 그렇지. 나는 그 시간 처음으로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시종일관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모든 말을 농담처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삶은 비워가는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채워가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삶을 견뎌내기’라는 제목의 산문집을 쓴 헤르만 헤세는 질곡이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런 책을 쓸 수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자기실현을 위해 한시도 노력을 쉬지 않는 사람만이 견디는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을 것 같다.
일상의 여러 가지 것이 힘겹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숨을 고르며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듯 ‘다스 레벤 베슈텐(Das Leben Bestehen)’이라고 소리 내서 말해본다. 독일어로 ‘삶을 견뎌내기’. 삶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닭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병든 노모를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쓸 것이다.
자기실현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날 밤 무라카미 하루키가 부러웠던 것은 그를 보기 위해 모인 2087석이나 되는 거대한 극장을 꽉 채운 관객이 아니라 바로 일주일 전에 새 소설을 끝냈다는 말 때문이었다. 다음 날인가, 어디 먼 나라에서 온 맹인 교환학생과 그의 충실한 맹인견 ‘안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우연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쓰겠다는 의지, 쓴다는 것의 순정함을 오랜만에 되찾은 느낌이다. 그러자면 우선 이 삶을 견뎌내고 볼 일이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작가로 남는 것이 이 부박한 삶을 견디고 있는 나의 꿈 중 하나이니까 말이다.
조경란 소설가
영화 프리뷰 >
-

프리미엄뷰
구독
-

여행의 기분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프리뷰]‘주홍글씨’…충격적인 21세기판 창세기 3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10/20/693139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