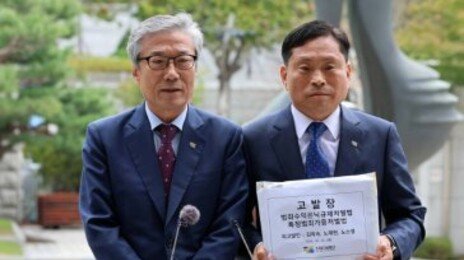▷이 대통령이 주 사장의 이야기에 놀랐다면 그게 더 놀랍다. 노조가 말한 ‘관행’은 10년이 넘었고 지금도 일부 계속되고 있다. 2003년 임명된 한국전력기술 C 사장은 출근을 가로막던 노조와 이면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반대로 별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노조는 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였고 이듬해 1월 C 사장은 이사회 의결도 건너뛰고 직원 1700명에게 54억 원의 상여금을 부당 지급했다. 노사분쟁으로 번진 탓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다. 다른 공기업에서처럼 ‘자리’와 ‘떡’의 거래를 발설하지 않았으면 슬쩍 넘어갔을지 모른다.
▷이런 탈선은 공기업 노조와 낙하산 사장의 합작품이다. 노조의 일반적인 ‘투쟁’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사장이면 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근 저지와 이면합의를 거쳐 실속을 챙기는 식이다. 낙하산이냐 아니냐는 별로 관계없다. 작년에도 한나라당 출신인 정형근, 김광원, 홍문표, 전용학 씨 등이 순조롭게 낙하산을 타고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았다. 해당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등의 표현으로 얼버무리자 상급 노총이 “노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었다. 반면에 몇몇 공기업에선 한동안 출근 저지가 이어졌다.
▷노조의 환영은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이 없도록 해 달라’, 반대는 ‘전임자들처럼 복지를 확충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어떤 부류든 낙하산의 소프트랜딩(연착륙) 비용이 많이 든다. 공기업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등장한 이 정부에서조차 낙하산 사장의 추가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지난 1년간 공기업 소음(騷音)에 시달린 국민은 묻는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왜 못 고치나.”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사설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11483.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