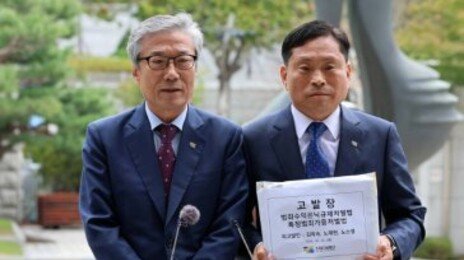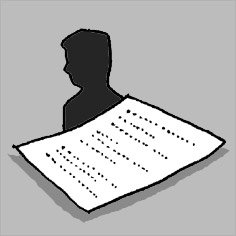
▷숙종 시절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1629∼1689)은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정하려는 숙종에 맞섰다가 사약을 받는다. 그가 죽기 직전 아들들에게 남긴 유서는 담담하면서도 간곡한 사연으로 공감을 준다. 김수항은 유서에서 ‘본래 재주와 덕이 없는 사람이 나라의 은총을 과분하게 받고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 스스로 화를 부른 것’이라며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까닭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곧 그만두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
▷그는 아들들에게 ‘벼슬을 해도 높은 자리는 피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는 늘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무덤 앞에는 작은 표석 하나만 세워줄 것을 부탁했다. 유서에는 사자(死者)가 세상에 남기고픈 마지막 말이 담긴다. 유서 앞에서 사람들은 겸허해지고 맑아진다. 이천보와 김수항의 유서만 읽어보아도 정치를 잘 펼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어리석기만 하다.
▷극단적인 죽음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는 단출하다. 그는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크다. 책을 읽을 수도 없다’고 적었다.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고도 했다. 그간의 심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도 담겨 있다. 정치적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연민의 정이 든다. 유서 앞에 앉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편다면 비극은 없을 것이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이주의 PICK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