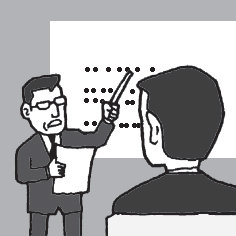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 자리가 신설됐다. 기존의 다른 대통령 특보와 달리 이희원 안보특보는 청와대에
상근하며 일정한 보수도 받는다.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에 있던 위기상황센터를 확대 개편한 위기관리센터도 관장한다. 즉 위기상황
관리는 특보가, 일반 안보정책은 수석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의 직무가 겹칠 가능성도
있다.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작은 구멍도 허용돼서는 안 되겠기에 걱정이 생긴다.
▷안보특보가 이끄는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에 대한 위기상황 보고와 함께 위기를 예방하는 일을 맡는다. 과거에는 정보를 중시했기에 국가정보원 간부가 센터를 이끌었다. 천안함 이후에는 위기예방이 핵심이라 현역 해군 준장에게 센터장을 맡겼다. 남북 간 충돌은 동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특수 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해군 장성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군 조직에서 육해공 3군 합동작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합참과 한미연합사다.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을 안보특보에 임명한 이유다.
▷안보의 양축은 군사동맹을 다루는 외교와 실전에 대비하는 국방이다. 천안함 침몰은 한국이 국방 수요가 많은 나라임을 실감케 한 사건이다. 직업군인 출신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는 외교 전문가를 외교안보수석에 임명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순수 민간인 출신인 지금은 반대로 가는 게 더 합당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외교안보수석이나 유사 보직을 맡은 이는 13명인데, 이 중 국방 전문가는 3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정훈 논설위원 hoon@donga.com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글로벌 책터뷰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동아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500명 수거해 처리’[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4/131036104.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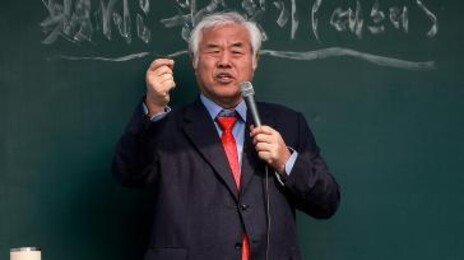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