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9월의 어느 토요일 이현표 주독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장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의 벼룩시장을 찾았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수북이 쌓인 진열대를 뒤적이던 그는 빼어난 미모의 여기자 사진이 표지에 실린 1951년 7월 초 판에 눈길을 빼앗겼다. 메릴린 먼로를 닮은 그녀는 1950년 당시 30세로 6·25전쟁에 종군한 마거리트 히긴스. 뉴욕헤럴드트리뷴의 기자였다. 그는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기도 전인 6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김포로 날아와 취재와 송고를 시작했다. 그리고 1951년 1월 전장에서 지낸 6개월을 기록한 비망록 ‘한국전쟁(War in Korea)’을 펴냈고 그해 퓰리처상을 받았다. 6·25에 관한 저술 중 가장 빨리 나온 것이었으며 여성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자였다.
혹적인 종군 여기자 히긴스
히긴스에게 이끌린 이 씨는 베를린의 헌책방을 돌며 이 책의 독일어 번역본을 구했다. 미국에 연락해 영어 원본도 샀다.
평택에서 히긴스가 목격한 최초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다. 한글 번역자는 “케네스 새드릭은 6·25전쟁 최초의 미군 희생자로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역주를 달았다.
우아한 매력에 활달함, 바이올린과 춤 솜씨로 무장한 히긴스는 맥아더 장군, 이승만 대통령부터 중공군 포로까지 두루 인터뷰했다. 덕분에 기록이 생생할 뿐 아니라 소설보다 흥미롭다. 또 전쟁 르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국가 존립의 이유, 국가 간 동맹, 성차별 문제, 인간적 신뢰와 유대 등 폭넓은 주제를 감수성 넘치는 언어로 다뤄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유명해진 히긴스는 미국 전역을 돌며 전쟁의 경험을 알리고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히긴스 기념우표가 나오기도 했다. 불꽃처럼 살던 히긴스는 45세에 요절해 알링턴 미 국립묘지에 묻혔다.
이현표 씨는 2005년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참사관으로 부임하면서 히긴스와 관련한 몇 가지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나 이 책의 한국어판이 없다는 것이 내내 맘에 걸렸다. 그는 2008년 귀국하면서 번역에 착수했다. 전사(戰史)를 뒤지며 생략된 사실들을 보충하는 것도 그의 몫이 됐다. 앞서 언급한 새드릭의 경우처럼.
강만수流권장도서목록 첫 순위
입소문을 타면서 국방부도 히긴스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6·25전쟁 60주년을 맞은 올해 그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현직 미 플로리다대 교수인 아들이 대신 받으러 온다. 끊어질 듯하던 한국과 히긴스의 아름다운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데 만 60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또한 승리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
60년 전 히긴스는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어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어지러운 지금,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경구 같지 않은가.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박중현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내란죄 수사 경쟁, 배가 산으로 가선 안된다[오늘과 내일/차진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8/13066763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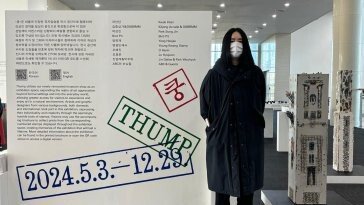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