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에서 벗어난 건 1971년 본격 보급한 통일벼 덕분이다. 통일벼는 수확량이 일반 벼보다 40% 많았다. 박정희
정부는 쌀 자급에 성공하자 1974년 매주 두 차례의 무미일(無米日·분식일)을 폐지하고 14년 만에 쌀 막걸리 제조를 허용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136kg)까지는 매년 늘어나다가 1984년(130kg) 이후 감소했다. 명절이나 생일에나
흰쌀밥을 먹을 수 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남아도는 쌀이 걱정거리가 된 것이다.
▷먹을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가 줄어 지난해 쌀 소비량은 1인당 74kg에 불과하다. 올해 농사 후 쌀 재고는 140만 t으로 적정량 72만 t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공비축 및 쌀값 떠받치기 용도로 쌀을 매입한 대금이 1조3000억 원이 넘는다. 사들인 쌀을 보관하는 데 570억 원이 들었다. 보관할 창고도 부족하다. 정부는 쌀을 주정 원료로 활용하고 쌀 음식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쌀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연간 36만 t의 묵은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 손실이 줄어들고 사료용 옥수수 수입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일본은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할 때 수확 후 2년 넘은 쌀은 가공용, 3년 넘은 쌀은 사료용으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6년 전부터는 사료용 쌀 품종을 개발해 ‘쌀 돼지’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도 못 먹던 쌀을 소 돼지에게 먹인다니” 하는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홍권희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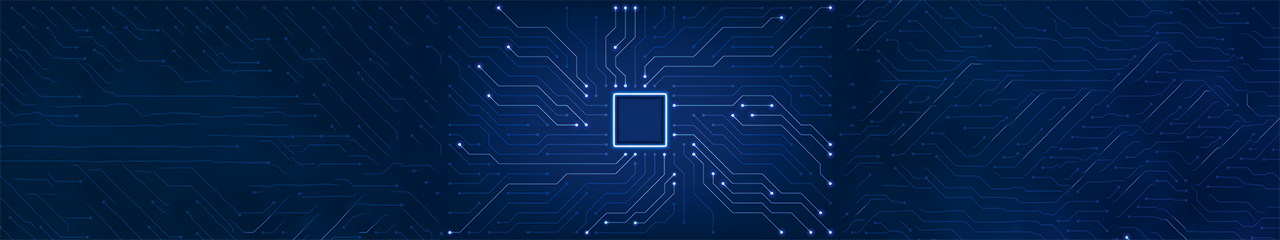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후벼파는 한마디
구독
-

e글e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신광영]그날 밤 국회 단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7/131049408.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