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궤도에 올라선 중소기업 오너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누구 내공이 더 깊을까.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대개는 전자가 깊고 강한 내공의 소유자라는 걸. 왜 그럴까?
오너는 때론 사업의 성패를 걸고, 드물게는 전 인생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 결단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대기업의 CEO라도 최후의 비빌 언덕은 남아 있다. 바로 오너다. 그게 오너와 CEO의 근본적 차이다.
이명박 정권의 오너는 누군가. 국민? 아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오너지, 일개 정권의 오너는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이 정권의 오너는 단연코 이 대통령이다.
보름 후면 정권의 오너가 취임한 지 3년.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정권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혼신을 던지는 오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재산까지 기부하고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일하는 MB로선 섭섭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에게선 정권의 성패를 온 어깨로 떠받치는 오너의 이미지보다는 최후의 결단만은 누군가에게 미루는 듯한 워커홀릭 CEO 이미지가 느껴진다.
왜 그런지, 개헌 문제부터 들여다보자. 이 대통령은 이미 1년 반 전인 2009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고 청와대는 일단 지켜볼 것”(이동관 대변인)이라며 팔짱을 꼈다. 때는 임기 초반. 친이명박계는 개헌을 위해 뛰어야 할 갈증을 못 느꼈다. ‘미래권력’을 자신하는 친박근혜계도 뛸 리 없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남 얘기 하듯’ 하다가 올해 신년좌담회에서 ‘아직도 안 늦었다’고 밀어붙이니 정치인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황당하게 느낀다. 친이계는 뒤늦게 개헌 의총 판을 벌였지만 동력 떨어진 지 오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 임기 후반 개헌 추진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 쉽다. MB가 정말로 개헌 의지가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임기 초부터 추진했어야 했다. 그래야 정권의 진정한 오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또 어떤가. 대선후보 때는 “정치적 이슈이니 정치가에게 맡겨달라”고 했다가 올 신년좌담회 때는 “과학적인 문제이니 과학자에게 맡기자”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있다. 정국 경색을 푸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연초니까 한번 만나겠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다.
개헌도 1년 반 동안 남 얘기 하듯
앞서 세종시 문제도 이런저런 ‘정치적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희생양이 됐다. 각종 인사도 ‘장고 끝에 악수(惡手)’를 두기 일쑤다. 오죽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MB는) 정주영 회장이 시키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을 뿐 무엇을 결정해본 적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을까. 도를 넘은 말이지만, 담고 있는 일말의 진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또한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제균 정치부장 phark@donga.com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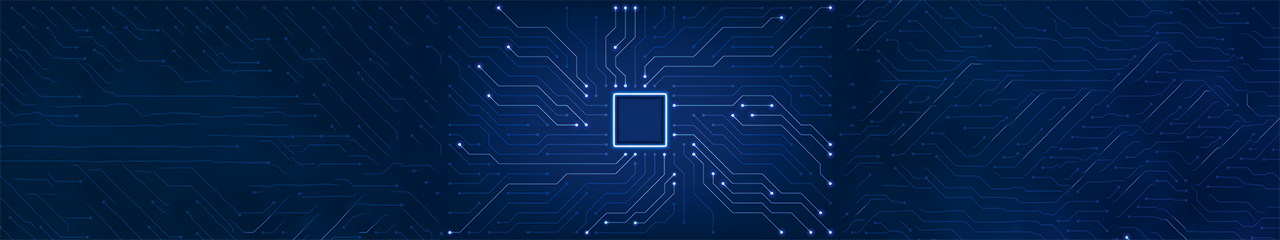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이정은]부정선거 의혹이 키운 혐중… 외교 부담만 커진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7/131049728.1.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