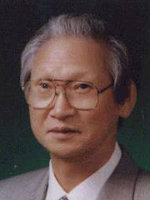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은 대립의 정치를 넘어 화합의 장을 이뤄냈다.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패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도중 기립박수를 보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격려를 보냈다. 여야 의원들은 정당별로 앉던 전통을 깨고 서로 섞어 앉아 70차례나 열렬히 박수를 쳤다.
이런 미덕의 근본은 미국의 교육에 있다. 초등학교에서 언어논리보다 감정지향적 대화 습관을 억제하는 훈련부터 시작한다. 대화 때 상대방의 인격과 대화 주제를 별개로 구분하는 이원적 사고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대방이 싫어도 그의 생각이 옳으면 받아들이고 대화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부분지향적 의사소통에 길들여지도록 교육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요점을 찾아 토론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요점이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으로 가자”는 말을 곧잘 한다. 화자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한다. 사실에 입각한 증거가 필요하지 증명과 무관한 감정적 대응은 논쟁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어려서부터 배워 체질화한다. 이처럼 자기 의사를 분석적, 귀납적으로 개진하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는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도 그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격론 후에도 앙금 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초중고교에서부터 대화와 토론을 가르쳐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합리적 대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민주적 사고와 행동이 몸에 밴 지도자와 민주적 시민이 있을 때 민주제도는 열매를 맺는다.
박명석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 자문이사 한국외국어대 재단이사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일천의 정보전과 스파이
구독
-

월요 초대석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청소년 SNS 중독… 우회 낳는 ‘규제’보다 ‘조절 교육’이 효과적[기고/김효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6/131042006.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