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재능 있지만 음악 문외한 음악가 보면 존경심부터 들어
“기타나 쳐볼까?”도전했다 코드 짚는 손가락 아파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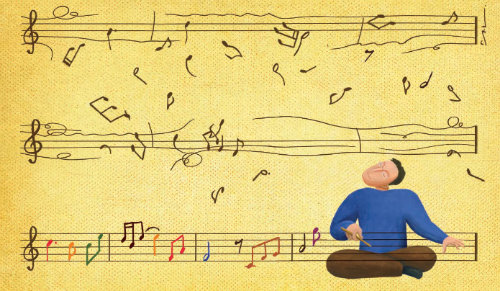

그러니 아무리 조리 있는 사람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대충 몇 가지를 주워섬기다 포기하고 말기가 쉽다. 그러면 나도 좀 머쓱해진다.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원인은 하나다. 그건 내가 예스맨이라는 것이다. 나는 극단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누가 나에게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한다. 싫은 일도 그런데, 하물며 새로운 분야의 일이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다하게 일을 펼치고 다니게 된 것은 다 주변 사람들이 시켜서 한 일이다. 시와 건축 이외에 맹세코 내가 스스로 펼친 일은 없다.
그런 와중에 나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음악이다. 나는 음악에는 젬병이다.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악기 하나 다루는 게 없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도 박자가 자꾸 늦는다. 음정도 틀린다. 완전히 제멋대로다. 아내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 “뭐라고?” 하고 묻는다. 노래가 아니라 얘기하는 줄 아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들이다. 음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존경하게 되는 습성까지 생겼다. 그들은 천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어떻게 그런 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에게는 불가사의하기만 하다.
제일 먼저 해 본 것이 기타였다. 흔한 악기 중에 하나였고, 남들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하겠다가 아니라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랴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상한 데서 불거졌다. 기타를 치려면 코드를 잡아야 하는데 쇠를 꼰 줄을 짚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픈 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참는 것일까. 괜한 엄살이라는 핀잔을 들으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은 굳은살이 생기면 나아질 거라고 용기를 주었지만 내 손가락은 굳은살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줄이 살을 파고들었다. 엄살이 분명하지만 나중에는 줄이 뼈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너무 아파서 손가락에 힘을 주지 못하니 소리가 제대로 날 리 없었다. 나는 기타를 포기했다. 그러나 코드를 바꾸기 위해 끄는 날카롭고 긴 음은 얼마나 매력적이란 말인가.
그러곤 리코더와 대금을 해봤지만 그 작은 구멍으로 손가락이 빠져버릴 거 같았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 구멍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 따끔거림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목젖도 불편했다. 그러니 트럼펫 같은 악기는 아예 꿈도 꿔보지 못했다.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거문고를 선물 받는 행운도 누렸지만 그 명주로 꼰 줄은 나에겐 공포였다. 벽에 걸어 놓고 18년 째 노려만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거문고의 몸에 현을 쓱쓱 문대는 소리는 곤충의 날개 비비는 소리처럼 얼마나 아련한가.
그러니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나에게 거의 악몽이다. 악기를 고정하기 위해 턱은 짓뭉개지고 손가락은 현에 잘려 버릴 것 같은 끔찍한 상상에 휩싸인다. 나에게 악기는 사랑스러운 몸이 아니라 단두대에 걸려있는 시퍼런 칼날 같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함성호 건축가·시인
죽기전에 이것만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죽기전에 이것만은…/김문정]훌쩍 커버린 아이들과 ‘테마여행’ 떠나고 싶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11/16/41906175.4.ep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