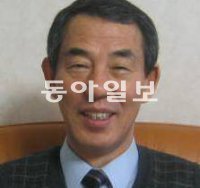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다. 눈발이 날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절기이다. 농가에서는 겨우살이 준비에 바쁘다. 김장을 담그고 지붕을 다시 이며 축사(畜舍)를 손질한다. 타작이 끝난 마당에는 짚가리가 덩그렇게 들어서고 벼 통가리가 배를 불리고 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뒤란 감나무에서 까치가 울고 있다. 마을 전체가 누런 햇볏짚 빛깔로 포근히 잠들어 있다. 겨울을 맞는 평화로운 농촌의 정경이었다.
어린 시절 마을에서 김장을 하는 날은 이웃 간의 잔치였다. 서로 돌아가며 겨울 양식을 장만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날을 특별히 ‘가정학습의 날’로 정해 하루 집안일을 돕도록 했다. 우리들은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를 열심히 날랐다.
물지게로 갯물을 길어 배추를 절이기도 했다. 해수(海水)의 염분이 배추의 숨을 죽이는 데 안성맞춤인 것이다. 갖은 양념으로 버무린 소를 넣고 싸먹는 배추쌈의 맛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어머니가 배추꼬리를 넣고 끓여주신 된장국으로 점심을 먹으면 입안까지 개운하다. 요즘 이만한 참살이(웰빙) 식품이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문득 그리워진다.
이어 아버지는 무청 시래기를 추리신다. 뜸을 엮듯 볏짚으로 길게 엮어 온도와 습도가 딱 맞는 추녀 밑에 걸어 두는 것이다. 겨우내 눈발을 맞으며 시래기는 점점 특유의 맛이 들어간다. 시래기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면서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한다. 추운 겨울날 적당량의 시래기를 삶아 나물을 무쳐 먹으면 구수한 맛이 온몸에 배어든다. 김장을 끝내고 얻게 되는 무청 시래기는 좋은 자연식품이다.
이제 이러한 풍속은 농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한다. 김장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로 북적대던 전통시장의 모습은 옛 풍경이 되고 말았다. 최근 배추 값이 폭락하자 농부들은 밭을 갈아엎기도 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추수가 끝난 들녘에는 바람이 세다.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웬일인지 향토시인 박용래 선생의 ‘겨울밤’이라는 시가 자꾸 생각난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밑 달빛은 쌓이리//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찻잔을 들며/정목일]12월에 새기는 목리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12/01/42274259.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