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을 칠 일도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내의 신경전이 어디 하루 이틀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 것은 아내 때문이 아니었다. 발단은 동창회였다.
오랜만의 동창회에서 옛 친구들을 만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싫었던 몇몇과 명함을 교환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배신감을 느꼈다. 세상은 믿었던 만큼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곳이었다. 혼자만 초라한 삶을 사는 듯한 자괴감에 서글퍼졌다. 그런 슬픔이 애꿎은 아내를 향해 폭발한 것이었다.
남자는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아내가 이불과 베개를 들고 사라진 건넌방으로 슬그머니 향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소스라치듯 놀랐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인터넷에 빠져 있었다. 연예인의 결혼생활부터 동창생의 유럽여행기, 전 직장 동료의 새집 이사, 옛날 친구가 시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자동차 등.
그의 타박에 아내가 발끈했다. “쓸데없는 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준 적 있어?”
우리가 불행한 이유 가운데 상당부분은, 남들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열린 창’이 너무 많아서 엿보고 싶은, 혹은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텔레비전 같은 화면들이 ‘열린 창’이다. 그런 창을 통해 남들의 ‘행복한 순간 편집본’을 보다가 비교모드에 빠져, 절망하고 분노한다.
남자는 다음 날 퇴근길에 선물을 구입했다. 자신과 아내를 위한 다이어리와 만년필.
거울과 셀프 카메라도 있지만, 그것들로는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 결국, 손 글씨로 적는 일기장만 한 것이 없다.
그는 식탁에 앉은 아내가 문학소녀처럼 고심하는 모습을 보다가, 일기장을 펴고 한 자씩 쓰기 시작했다.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고, 그 마음을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아주는 것, 만족이란 애초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었다. 순수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상복 작가
작가 한상복의 남자이야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헬스캡슐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작가 한상복의 남자이야기]빅 브러더보다 무서운 ‘빅 마누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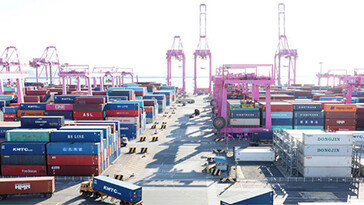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