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킷 리스트 작성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 즉 현재를 즐긴다는 각오로 쾌락주의적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금욕적 실현 방식을 찾는 것이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 고상한 바람과 세속적 욕망 가운데서 버킷 리스트는 정해진다. 해야 할 일을 적는 사람들은 남은 삶을 더 알뜰히 단속하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적는 사람들은 충분히 즐기지 못한 삶의 여분을 지키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금 세 살인 딸, 남편과 함께 시간의 구애 없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너무 평범하다 싶겠지만, 내겐 이 평범한 바람이 쉽지 않은 일이 된 지 오래다. 사실 첫 아이이자 유일한 아이이기도 한 녀석을 낳기까지 꽤나 많은 계획을 세웠다. 계획의 기준은 나의 일이었다. 충분히 일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아이를 낳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갈등을 버리고 온전히 아이와 남편에게만 집중한 채 일상을 떠나는 것, 돌아오기 위한 휴가가 아니라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여행을 탐내는 것이다. 헤밍웨이가 커피를 마셨을 파리의 카페나 코트다쥐르 해안 혹은 피터 섀퍼가 희곡을 썼던 런던이나 뉴욕이면 더 좋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적게는 세 달, 많게는 몇 년을 그렇게 이 땅과 시간, 돈, 일을 잊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사실 이건 더 간절한 것인데, 그것은 나만의 ‘연당집’을 만드는 것이다. 오정희의 소설 ‘옛우물’에는 주인공이 고즈넉한 오후면 찾아가는 빈집이 등장한다. 그녀가 빈집에 가기 위해선 연당집이라 불리는 고택을 거쳐 가야 한다. 연당집은 누대로 당상관 다섯과 바보 아들 아홉을 냈다. 여자는 빈집에 머무르며 연당집을 바라본다.
빈집에서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낯설었던 남편을 떠올리고 젖꼭지에 매달리던 아이를 팽개치고 만났던 한 남자를 추억한다. 바보도 낳고 정승도 낳았던 연당집은 아마도 젊은 시절의 욕망이 남긴 공간적 상징일 테다.
서른여섯, 내 눈높이에선 아직 연당집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딱 그만큼의 빈집, 혼자만 알고 있을 그런 빈집이 필요하다.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지나가는 길에 연당집이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비밀이 없는 삶은 가난하다. 빈집엔 후회도 남겠지만 기쁨도 남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빈집은 필요하다. 나만이 알고 있을 그 공간, 영원한 암호인 죽음과 만나기 전, 빈집 하나는 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죽기전에 이것만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박상준 칼럼
구독
-

여행스케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죽기전에 이것만은…/반칠환]마법을 배워 유년시절로 돌아가고 싶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7/04/4750932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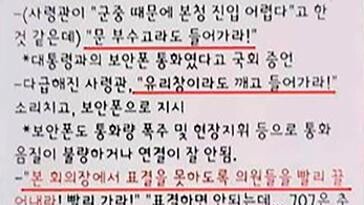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