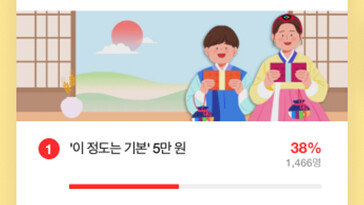검찰의 두 차례 불법사찰 수사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국조(國調)로 직행한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의 냄새가 나는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검찰이 눙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이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시사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입막음용 돈까지 줬다는 폭로와 관봉(官封)이라고 찍힌 돈까지 나왔다. 청와대는 최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 일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똑같이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올해 4월 현 정부의 사찰문건이라고 폭로한 2619건 가운데 80% 이상은 노 정부 때 작성된 것이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노 정부에서는 조사심의관실 소속으로 똑같은 사찰 업무를 수행했다. 사법적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다했을지라도 국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의 사찰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에는 이해찬 대표가 친노세력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DJ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를 정리한다며 유신과 광복 전후,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100년도 더 지난 구한말 동학혁명까지 들춰냈다. 이에 비하면 두 정부 때의 사찰은 과거사라고 부를 수도 없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구독
-

서광원의 자연과 삶
구독
-

맛있는 중고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살펴 달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21/13090904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