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그린란드를 방문한 이명박(MB)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다 해외순방 기록자다. 2008년 취임 이후 9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65개국(중복 방문국가 포함)을 방문해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전 기록은 노무현 대통령의 27회, 55개국이다. 외교안보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DJ) 대통령은 23회 37개국, 김영삼 대통령은 14회 28개국에 그쳤다.
대통령 해외순방이 늘어난 것은 국가역량이 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양자협의와는 별도로 한국이 꼭 참여해야 하는 다자(多者)회의가 많아졌다. 환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APEC은 물론이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는 한국 대통령의 정례회의다. 최근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연달아 개최했다.
대통령도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다.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DJ는 평화대통령, 인권대통령으로서 유명해져 해외에서 인기가 높았다. 취임 1년도 안 돼 “대통령직 못해먹겠다”고 푸념했던 노 전 대통령이었지만 외국에 나가는 일을 즐겼다. 동포간담회에서 즉흥 연설을 하는 것이 낙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해외에 나오면 대접을 잘 받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해외경험이 많은 MB는 외국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때로는 외국정상과도 과감한 스킨십을 보였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자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과묵한’ 모습을 보였다. 정상외교 수행경험이 많은 한 인사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여러 명 모여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는 포맷이 거북했던(uncomfortable)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무하다시피 한 해외여행 경험과 외국어 장벽도 한몫했을 수도 있다.
정치의 ‘잃어버린 10년’ 세월이 외교안보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진 일본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2006년 이후 매년 바뀌어 온 일본 총리의 존재감은 ‘제로’에 가깝다. 53개국 정상이 참가한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단 한 건의 양자정상회담도 갖지 못했다. 일본 특파원들은 “나도 우리 총리나 외무대신 이름을 모른다”며 “다음 회의 때면 또 바뀔 총리하고 누가 중대사를 논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올해 대선의 주요과제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부패척결, 정치개혁, 교육개혁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한국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하고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교양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남북분단을 상수로 간주한 한미동맹 체제를 뛰어넘어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facilitator)가 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에 기여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미국의 대통령과 나란히 섰을 때 가장 내공 있게 상대를 대할 인물을 12월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발리볼 비키니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송평인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유성열]‘국민저항권’ 잘못 해석한 尹 지지자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21/13090901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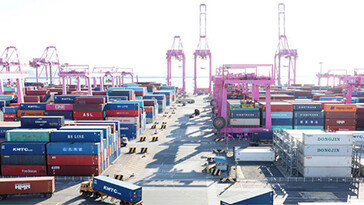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