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열렸던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9일(현지 시간) 폐막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과거에는 해삼이 지천으로 널렸다 하여 중국령 해삼위(海蔘威)로 불렸지만,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 제정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 러시아어로 ‘동방을 정복하라’라는 의미이다.
APEC 열린 블라디보스토크의 뜻
이번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러시아 정부가 쏟은 열정과 의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러시아 국제행사는 주로 수도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블라디보스토크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07년, 이번 APEC 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유치하면서 ‘2013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개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장기부흥계획을 세워 철도, 에너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재정비와 확충을 위해 무려 223억 달러를 투입했다. 올 5월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극동개발부’까지 신설했다.
러시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극동 개발에 나선 이유는 자원 확보 때문이다. 현재 모스크바의 전략가들은 냉전시절 소련이 실패한 이유가 미국과의 자원 확보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자원의 보고(寶庫)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 없이는 과거와 같은 영광을 재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아태지역이 점차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새로운 지리적 중심부로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극동 개발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극동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불법 이주민들이 들어와 국가 안보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도라는 게 러시아 정부의 인식이다.
푸틴의 소위 ‘블라디보스토크 키우기’는 지난 20세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출발했던 미국이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건설을 통해 태평양의 파고를 넘어 동아시아를 향해 국력 팽창을 모색했던 것처럼 현대 러시아도 잠자고 있던 블라디보스토크를 깨워 명실상부하게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서의 공고한 ‘닻’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동진 정책이 영토 팽창을 위한 군사적 진출이 목적이었다면, 21세기 신동진 정책은 새로운 국부 창출과 아태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진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동을 21세기 경제전쟁 교두보로
푸틴의 러시아가 역내에서 핵심적 지정학적 행위자로 부상하기 위해 동원하는 경제적 지렛대는 에너지, 철도, 전력, 광물, 식량 등 전략재인데 이 모두는 한국의 존립과 국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자원들이다. 이 밖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창설, 북극항로 개발, 남-북-러 삼각경협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러 양국이 추구하는 국익을 고려할 때 푸틴의 신동진 정책은 도전보다는 기회적 요인이 더 크고 더 많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현실은 공고한 대러 협력관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 한-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심화시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를 새롭게 볼 시점이다.
시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프리미엄뷰
구독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軍 무력화하는 낮은 성인지감수성[시론/민무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6/07/10729737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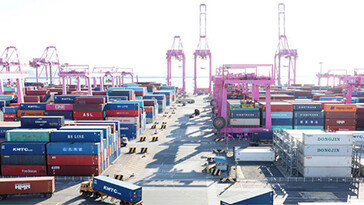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