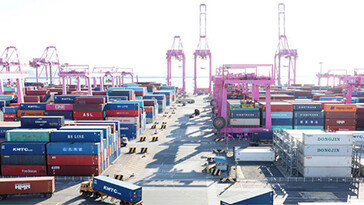근로자 수 300명, 자본금 80억 원, 매출 1500억 원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다.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제조업체 10개 중 3개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다. 회사를 쪼개거나 사업부문을 통째 매각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매출 투자 고용의 확대를 포기하거나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전체 경제를 위축시키는 일도 있었다. 불필요한 분사(分社)는 관리비 증가로 생산성 손실을 가져온다.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세액공제 세액감면 정책자금 외국인인력공급 판로확보 등 160여 개 지원이 사라지는 반면 시장진입 세무 회계 등 각종 규제가 기다린다. 중견기업이 커져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34개 법령에 근거한 84개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니 스스로 성장판을 닫고 보호의 껍질 속에 안주하는 것이다.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및 대기업 규제 때문에 생긴 ‘정부의 실패’다.
19일 대선 결과 출범할 새 정부는 성장을 회피할 만큼 남발된 중소기업 지원책을 재검토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중견기업이 마음 놓고 대기업으로 커가고, 대기업은 세계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대책회의를 여는 것보다 성장의 족쇄를 푸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서광원의 자연과 삶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살펴 달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21/13090904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