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맞춤형’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난 50년간 복지정책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모든 국민을 사회안전망이라는 우산 속에 보호하는 양(量)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비교적 짧은 기간인 각각 12년 만에 전 국민에게 적용됐다.
하지만 아직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많은 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상당수이고, 국민연금은 농어민과 자영업자 중 약 절반인 400만 명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가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험료 부과징수 책임을 국세청에 넘겨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수준이 낮아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전문서비스가 부족하다. 제도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 이제는 여기저기 뚫린 구멍을 메우고 보장 수준을 두텁게 해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복지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복지서비스 전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재는 읍면동 직원 한두 명이 복지부 등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내려오는 300여 개의 복지프로그램을 맡고 있어 효과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선진국처럼 시군구 단위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복지사무소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예산 낭비와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고용·복지담당 부서가 통합될 필요도 있다.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보수가 매우 낮아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를 안정시켜줘야 한다.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국민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사회복지비에 쓰고 있으나, 복지국가가 되려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를 전액 정부재정으로 부담할 수는 없으며 사회보험료와 적절한 수준의 민간부담으로 분담하는 지혜를 짜야 한다. 정부재정도 중앙정부의 부담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확충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동아리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격화될 우주경쟁, 한국도 상업발사 기술혁신 서둘러야[기고/김승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1/13047980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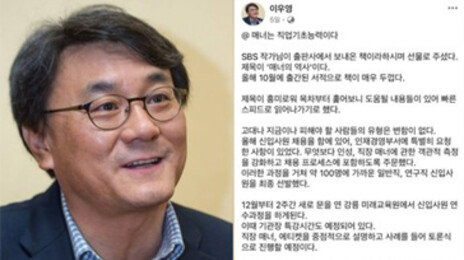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