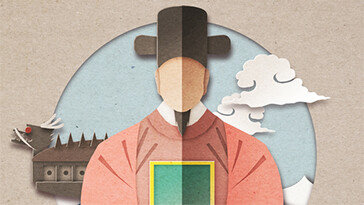한국 노인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노후보장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한 유럽에선 은퇴를 해도 일할 때의 70% 안팎에 이르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빨리 은퇴하고 노후를 즐긴다. 우리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70%나 되고, 연금을 받더라도 액수가 적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 노인들의 소득 빈곤율(‘빈곤’에 해당하는 소득층)은 45.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65∼79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36.6%) 농림어업(34.4%) 순으로 많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산층 노인도 많다. 일부에서는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 수준은 할아버지의 지갑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손자까지 책임지는 노인들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불과 13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여러 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다. 풍부한 직업 경력과 인생 경험을 가진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설 >
구독 780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구독 175
-

어린이 책
구독 14
-

딥다이브
구독 493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4/13103632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