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치행위로 여겨지는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단계부터 극소수 내부자만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의 영역이다. 평양에서 진행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수뇌부가 나눈 대화 내용 중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문에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문구가 담기기까지의 내막을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 2007년 우리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까.
그런 면에서 이명박(MB) 대통령이 퇴임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발된 2009년 정상회담 추진상황을 자진해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며 정상회담에 목매지 않자 2009년 가을 북한이 중국을 통해 먼저 정상회담을 타진해 왔고, 정상회담 대가로 5억∼6억 달러 규모의 현물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됐다는 게 요지다. 5년 대북(對北)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런 소리도 듣기 싫었기 때문에 비밀의 한 자락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과거 5년의 행적을 쫓다보면 MB 정부가 정상회담의 효능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대의 역량을 쏟아부었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2010년 가을 김숙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은 3, 4차례 평양으로 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던 남북관계 출구전략과 정상회담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결과는 실패.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한 북한 실무진의 재량범위가 극히 좁았던 탓이 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직접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응당 정상회담에 나서려 했겠지만 MB는 이 시점에 뜻을 접은 것 같다.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 봉사하느니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다”는 말로 당시 기류를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비핵화’ 세 글자만 써주고는 ‘이제 논의 끝’이라는 북한의 태도에서 정상회담을 할 아무런 메리트도 발견하지 못했으리라.
정상회담을 남북관계 돌파구의 최종병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들으면 ‘궤변’이라 할 소리지만 MB 정부 사람들은 “남들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도 정상회담 할 수 있었다”는 말을 종종 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만나주는 것 자체를 시혜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 결국 회담 불발의 본질적 이유”라고 했다. 원칙을 지킨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악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기를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진전의 호기를 놓친 실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성사되지 못한 세 번의 정상회담 시도 과정에서 남북 간에 은밀하게 벌어졌던 일들을 세밀하게 복기하고 전략적 실패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일은 어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몫이다. 이를 위해 MB 정부 정상회담 ‘실패의 기록’이 가감 없이 새 정부에 넘겨져야 한다. 우리 대표단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요구 시 내걸었던 조건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이 꿈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도 결국은 과거 정부에서 남북 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팩트 파인딩’이라고 본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김윤종]아이가 숨진 후에야 법을 만드는 나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4/131036282.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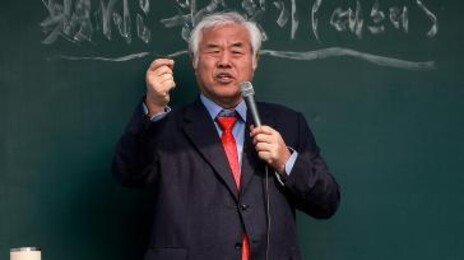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