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 기자가 쓰는 ‘김지하와 그의 시대’]<35>인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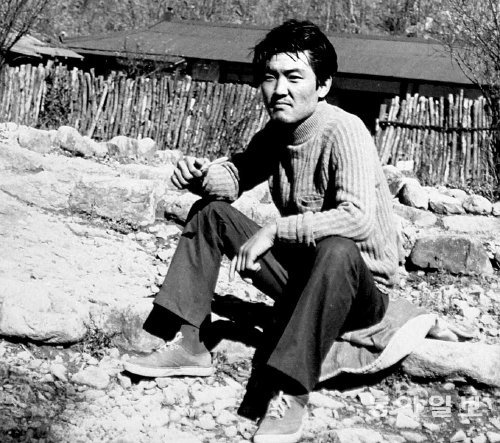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은 육사를 졸업하고 1965년에 정보장교의 길을 택해 중앙정보부에 공채로 들어간다. 이후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쳤으며 11∼14대 국회의원, 민정당 원내총무·사무총장을 지냈다.
이종찬 김지하 두 사람의 만남은 김지하가 ‘오적’을 발표한 직후인 1970년 여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자는 두 사람의 만남을 취재하기 위해 이 전 원장을 만났다. 그는 1970년 어느 날, 자신이 쓴 일기를 보여주었다. 그 일기를 보면 정보부에 근무하는 직업적 관심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시 한 편으로 정국을 뒤흔들던 김지하에 대해 그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전 원장은 ‘오적’이 나온 직후 정보부의 분위기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다.
“제일 먼저 청와대에서 대로(大怒)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정보부를 방문해 김계원 정보부장에게 엄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상징적인 시작(詩作)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구성 요건상 수사할 근거가 없었다. 더욱이 국제 펜(PEN)클럽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작가를 구속, 탄압한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 딜레마에 빠졌다. 마침 김지하가 폐병을 앓고 있어서 각혈까지 하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강창성 차장보에게 김지하를 구속하는 것은 자칫 긁어 부스럼을 키우는 격이 될 것이니 요양원으로 보내 서울에서 격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어느 날 저녁, 이 전 원장은 김지하를 직접 설득하겠다며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난다. 만남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은 흥국탄광 도계광업소장 박윤배였다. 박 소장은 이 전 원장과 피란 시절 대구에서 전시(戰時) 연합중학교를, 서울에서 경기고를 같이 다닌 가장 친한 친구였다. 또 김지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김지하가 평소 ‘친형님’처럼 모시던 사이였다. 기자가 이 전 원장에게 김지하의 첫인상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김지하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가 애국지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의 운을 타고나지 못해 반정부의 길을 걸으며 시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어떻든, 그날 이후 나는 최대한 그를 보호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연락을 바로 할 수는 없었으니 박윤배를 연락책으로 삼았다.”
기자는 이 대목에서 이 전 원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보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반정부 인사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조언한 것은 조직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 아닌가?” 이 전 원장은 당시 정보부 내에 분위기를 전하며 이렇게 답했다.
“김 시인처럼 국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안 담당 부서가 맡았는데 그들은 기관을 위해서도 충직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오적’ 필화사건으로 김지하가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인 71년 4월 초 어느날, 그와 비밀리에 마주 앉는다. 마침 며칠 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의 화제는 ‘김대중 후보’였다.
“소주와 오징어포를 서로 나누면서 한나절을 같이 보냈다. 나는 그때 김 시인으로부터 김대중이란 인물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들었다. 혹시 ‘김지하가 김대중과 같은 목포(木浦) 출신이라 의기투합한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듣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다. 김 시인은 재야 세력과 가까웠지 직접적으로 김 후보와 관련은 없었다. 그러나 대선에서 김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었다. 요샛말로 김사모(김대중을 사랑하는 모임)라고나 할까…그는 그날 답답한 심정에 ‘쿠데타’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대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정확하지 않았다. 박 정권이 독재, 부패, 무능하니 무조건 뒤엎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이었다.”
이 전 원장은 한때 김지하 혹은 그를 둘러싼 그룹이 북한과 연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반항과 가까웠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인간 존중의 ‘자유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집안 내에서 기본적으로 통했던 우당정신(友堂精神·이 전 원장의 조부(祖父)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사상)과도 통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비밀리에 우정을 쌓아가던 와중에 72년 봄 다시 ‘비어’ 필화사건이 터진 것이다. ‘창조’지의 주간과 편집장이 붙들려가고 김지하는 수배되었다. 이 전 원장 말대로 “이번에는 간단치 않았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허문명기자가 쓰는 김지하와 그의 시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리
구독
-

교양의 재발견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올해의 작가상’ 개그맨 고명환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비법은” [인생2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81832.4.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