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나라
―함기석(1966∼ )
없는 초원에서
없는 말들이
없는 갈기를 휘날리며
없는 꿈길을 달려 내게로 온다
없는 안장에 나를 태워
없는 나라로 간다
없는 나라에 도착해 보니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
없는 길들이 보인다
없는 시계들이 걸어다닌다
없는 거울들이 나무들이 걸어다닌다
없는 시인들이 없는 시를 쓴다
없는 화가들이 0차원 그림을 그린다
없는 영화관에선 없는 영화가 상영되고
없는 개들이 없는 담배를 피며 내게 묻는다
없는 당신!
없는 삶을 끌고 왜 여기까지 왔소?
하도 ‘없는’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얼핏 장난스러워 보이지만 허망한 삶의 양태에 대해 역으로 묻고 있는 것 같다. 내 삶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삶이 실제냐, 허구냐? ‘없는’의 피수식어들이 휘적휘적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이 무성영화처럼 돌아가다가 돌연 능동적 장면으로 강렬하게 마무리한다. ‘없는 당신!/ 없는 삶을 끌고 왜 여기까지 왔소?’ 이 시에서 유일한 능동적 행동인 발화(發話), 발화 중에서도 능동적 발화인 질문! 독자의 몽몽했던 정신이 확 깬다. 그 질문을 하는 게, 내가 특별히 개를 낮추어 보는 건 아니지만, 하필 개들이다. 그것도 담배를 피우는 개들. 담배를 피우고 철학적 질문을 하는 개가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수식어 ‘없는’이 개와 담배에 외려 실체감을 준다. 말장난 속에 뼈가 있다. 재밌으면서도 서늘한 감동을 주는 시다.
황인숙 시인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법조 Zoom In :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기차표 운동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05/31/5553747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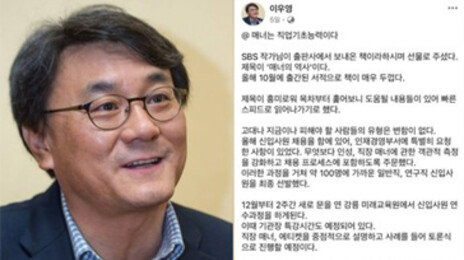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