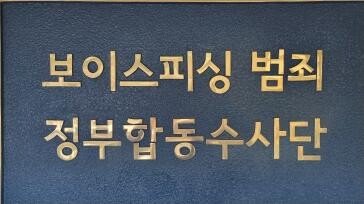전작권은 2007년 2월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 17일 한국 측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하기는 했으나 국내에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대신 한국 합참의장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연합방위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전환 시점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논의에서 최종적인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전투형 강군(强軍) 건설을 위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작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실망스럽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국회는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리가 재연기를 제안한 목적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이번 제안이 전작권을 넘겨받기 싫어 미적거리는 것처럼 미국에 비쳐서도 곤란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6/1312184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