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우(1934∼1990)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상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날마다 출근길에 버스를 내려 걸어가는 광화문 길목에서 6·25의 기억과 일상적으로 만난다. 길거리 사진전에서 마주치는 헐벗고 굶주린 피란민들과 전쟁고아들. 요즘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서 종종 소개되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 1950년대 초반 이 땅의 자화상이다. 필리핀 터키 할 것 없이 온갖 나라가 다 들어와 불쌍한 코리아를 도와주자며 전쟁에 참여한 그날의 기억이 알록달록한 국기들 아래 펼쳐져 있다.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과거를 더듬는 사람은 대개 외국인 방문객이다. 어디론가 분주히 걸어가는 내국인들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멀어진 지금, 우리 피붙이가 겪어 낸 아픔도 먼 나라 일처럼 현실감이 없어진 것인가.
‘분단의 풍경’이란 책을 최근에 펴낸 화가 김혜련 씨의 작품은 마치 시의 전언을 그림으로 풀어낸 듯 아름답고 처연하다. 우리 산하를 그린 풍경 속에 날카롭게 찢긴 자국과 이를 한 땀 한 땀 봉합한 바느질이 만나 ‘동쪽의 나무’ ‘눈산’ 연작을 이룬다. 작가는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품에 안은 국토를 응시하며 아픔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을 일깨워 준다.
다양한 정전협정 60주년 행사가 나라 안팎에서 열리고 있다. 미술계도 분단 현실을 가장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와 서해 최북단 섬을 찾아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 ‘백령도-525,600시간과의 인터뷰’란 전시 제목이 눈길을 붙잡는다. 우리가 서로에게 넘을 수 없는 문지방을 만든 지가 어언 52만5600시간!
그 환갑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선 입만 열면 여전히 강조하는 단일민족이 대치국면을 이어 가고 있다. 언제 철이 드는가. 시인이 오래전에 말한 불안한 얼굴, 믿음이 없는 얼굴들이 오늘도 서로를 노려본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고미석의 詩로 여는 주말]‘여름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08/10/5694022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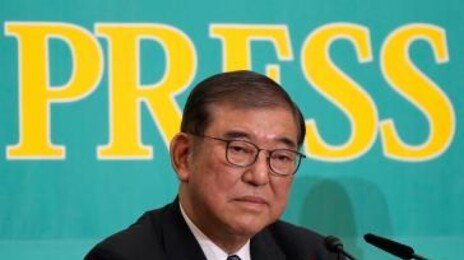

![주거 가성비 끝판왕 ‘천원주택’ 신혼부부 신청 북새통[영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309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