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기록문화 강국이다. 올해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2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총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건수로 볼 때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1위이자 세계 3위다. 일본인은 비행기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메모를 한다는 데 정작 세계기록유산은 야마모토 사쿠베이 컬렉션 하나뿐이다.
훈민정음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이 많지만 늘 탄복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조선왕실의궤다. 조선왕실의궤는 후손들이 행사를 잘 치르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왕실 행사를 그림과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겨 놓은 책이다.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을 쓴 국사학자 한영우 씨는 의궤를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했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으로 행차할 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화성행궁도, 타고 갔던 가마의 도면,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 잔칫상에 정조가 받은 음식 차림표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경탄을 넘어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정조의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 화성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다.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기록에 대한 집착은 심하게 표현하면 ‘광적’이었다. 임금이라도 사초(史草)를 볼 수 없던 관행이 세종시대에 확립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종대 신하들은 왕의 잠자리까지 기록하려 들었다. 후세 사가로부터 우유부단하다고 평가받았던 중종은 이에 반대하지 못하고 “경의 말이 맞긴 한데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여자사관이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신하들은 “언문으로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는데 여자사관이 있었다는 말은 못 들었으니 왕의 잠자리를 기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실록은 단순한 역사기록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지혜와 상상력의 보고다. 조선왕조실록을 세 번 이상 완독했다는 ‘조선왕조 500년’ 작가 신봉승 씨는 통치자가 전범으로 삼아야 할 모든 것이 실록에 있다고 말한다. ‘허준’ ‘대장금’ ‘이산’ ‘왕의 남자’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실록에 나타난 단 한 줄을 기초로 시나리오가 작성됐다.
일제강점기에 망가진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김경수 전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2008년 4월 11일 노 전 대통령이 썼다는 메모가 그대로 올라와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노 정부 시절이다. 그런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중요한 기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으니 황당하다. 따로 제작된 국정원판 대화록이 있고 음성녹음도 존재하기 때문에 발언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만 기록물 관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다른 중요한 기록물도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이 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실수인가, 의도인가. 파기되었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런 것인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순한 부주의로 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을 나중에 글로 정리해 놓으면 부끄러움에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었기에 사관들이 사초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지 않았을까.
정성희의 사회탐구 >
구독 0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현장속으로
구독 12
-

고양이 눈
구독 85
-

내 생각은
구독 6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1개
![[정성희 칼럼]절전, 많이 당황하셨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08/22/5715651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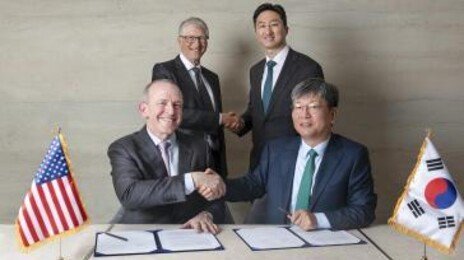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9746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