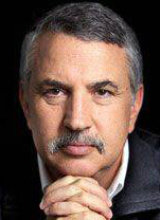
요즘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연일 불편한 사진들이 뜬다. 최악의 사진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 모습들이다. 지난주 카이로 중심가 ‘10월 6일 다리’에서 막 굴러떨어지는 순간의 이집트 경찰차의 모습도 민간인 사상자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시위대가 다리 밖으로 차량을 밀어냈는지 아니면 공포에 질린 운전사가 다리 난간을 부수고 나일 강으로 뛰어들었는지 언론 매체의 설명은 엇갈린다. 둘 중 어느 상황이었든 다리는 심하게 부서졌고 차량은 빠졌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운명도 알 수 없다.
그 사진은 쇠퇴하는 이집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암울한 사실은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없고, 나아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집트 국민은 둘 가운데 하나만을 고를 수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던 1952년으로 나라를 되돌리고 싶어 하는 군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슬림형제단이다. 형제단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지배하는 반(反)여성적이고 반다원적이며 편협한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집트병에 대한 해답으로 보고 있다. 이슬람교가 시작된 622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동유럽은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따라서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 붕괴 때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민주적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독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랍 국가들과 달리 동아시아의 독재자들은 ‘근대화의 역군(modernizer)’이었다. 그들이 초점을 맞췄던 사회기반시설 구축, 교육, 기업가정신, 수출주도형 경제 등은 교육받은 중산층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중산층은 ‘장군들’로부터 비교적 평화롭게 자유를 쟁취해냈다. 또 동아시아에는 일본이라는 모델도 있었다.
아랍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전통 자체가 없었다. 근대화에 나선 독재자도, 그에 따른 교육받은 중산층도 없었다. 또 유럽연합(EU)처럼 국가들을 한 곳에 모으고 본보기 역할을 해줄 존재도 없었다. 결국 아랍이 깨어나며 그 뚜껑이 열렸지만,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이라는 두 개의 ‘옛것’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진보적 운동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압둘 파타 알시시 장군이 꾸린 이집트 과도정부 내각은 제3의 길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하지만 내각이 두 발짝도 떼기 전에 군과 경찰은 무슬림형제단을 뿌리 뽑으려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형제단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형제단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40개 가까운 교회를 불태우고 더 나아가 경찰관들을 죽이기도 했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세계의 눈/데이비드 브룩스]중동, 종파 분쟁이 더 문제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09/02/57369103.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