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렌 켈러의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처럼 나도 사흘만 들을 수 있다면, 장사익 선생님의 노래를 꼭 듣고 싶어요.”
친한 분을 통하여 테레사라는 세례명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편지를 접하게 되었다. 10여 년 전에 그녀는 친구 손에 이끌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장사익 콘서트에 갔는데 비록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열창하는 모습에서 “소리를 보았다”고 했다. 그 이후, 사흘만 들을 수 있다면 장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무시로 장 선생님의 노래를 듣는 나로서는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다. 내게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궁리를 했다. 장 선생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테레사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마침내 우리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윽고 장 선생이 화답하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한 발 한 발 마치 노래가 자신을 끌어당기기라도 하는 양 조심스럽게 장 선생에게 다가가더니 갸웃이 귀를 기울이고 서는 게 아닌가. 기쁨에 찬 그 얼굴이 천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천사의 표정 같았다.
그날 그녀는 장 선생과 모임을 주선한 나에게 몇 번이나 행복하다며 감사를 표했지만 정작 감동한 사람은 나였다. 들리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와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다. 200년 전 베토벤도 그랬을까? 말년에 자신의 교향곡을 지휘할 때 그는 귀가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음악을 들었을 것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진정 보려고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세영 수필가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홍은심 기자의 긴가민가 질환시그널
구독
-

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북한산을 바라보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11/28/5918890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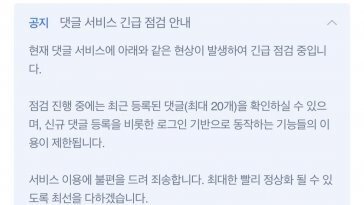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