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일이다. 그해 여름 내내 그분을 뵙지 못했다. 그런데 가을에 이르러 그분의 편지가 도착했다. 마지막 편지였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고, 부고를 하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가족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편지를 발송해 내가 편지를 읽었을 때는 돌아가신 지 보름쯤 지나서였다.
세상에 없는 분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이 묘한 감정에 빠지게 했다. ‘지는 생명의 불꽃 앞에서’라는 제목이 붙은 편지에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허물로 상처받은 것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나의 허물과 함께 나를 사랑한 친지여 세상이여 정말 고맙소”라는 구절도 있었다. 그분은 초서의 대가로 이름을 떨친 서예가 취운 진학종 선생이다.
선생은 명성만큼이나 고집도 남다르셨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늘 따뜻하셨다. 같은 빌딩에 입주한 인연으로 자주 뵙게 되면서 그분의 전시회에도 참석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좋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다. 80대의 연세에도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취운 선생의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다. 혹시 그분에게 상처받은 분이 있다고 해도 이 마지막 편지에 봄눈 녹듯이 풀리지 않았을까? 선생은 편지의 말미에 “내면의 자유와 평강이 모두에게 임하기 바라오. 나와 함께 영원히!”라고 적었다. 그분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도 이별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취운 선생의 뜻대로 될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이 특별한 편지를 3년 동안 보관해 왔거니와 며칠 전에는 자제분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아버님 3주기를 맞이하여 생전에 아버님과 친했던 분들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참석해 달라는 초청이었다. ‘부전자전’이다. 취운 선생 부자(父子)로 인하여 예의 바른 이별이 역설적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윤세영 수필가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괜찮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12/19/59649499.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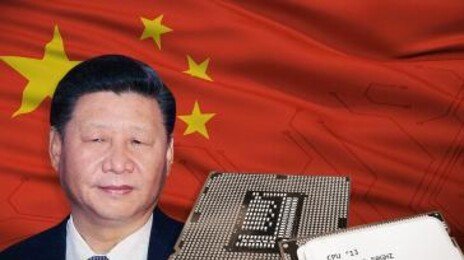

댓글 0